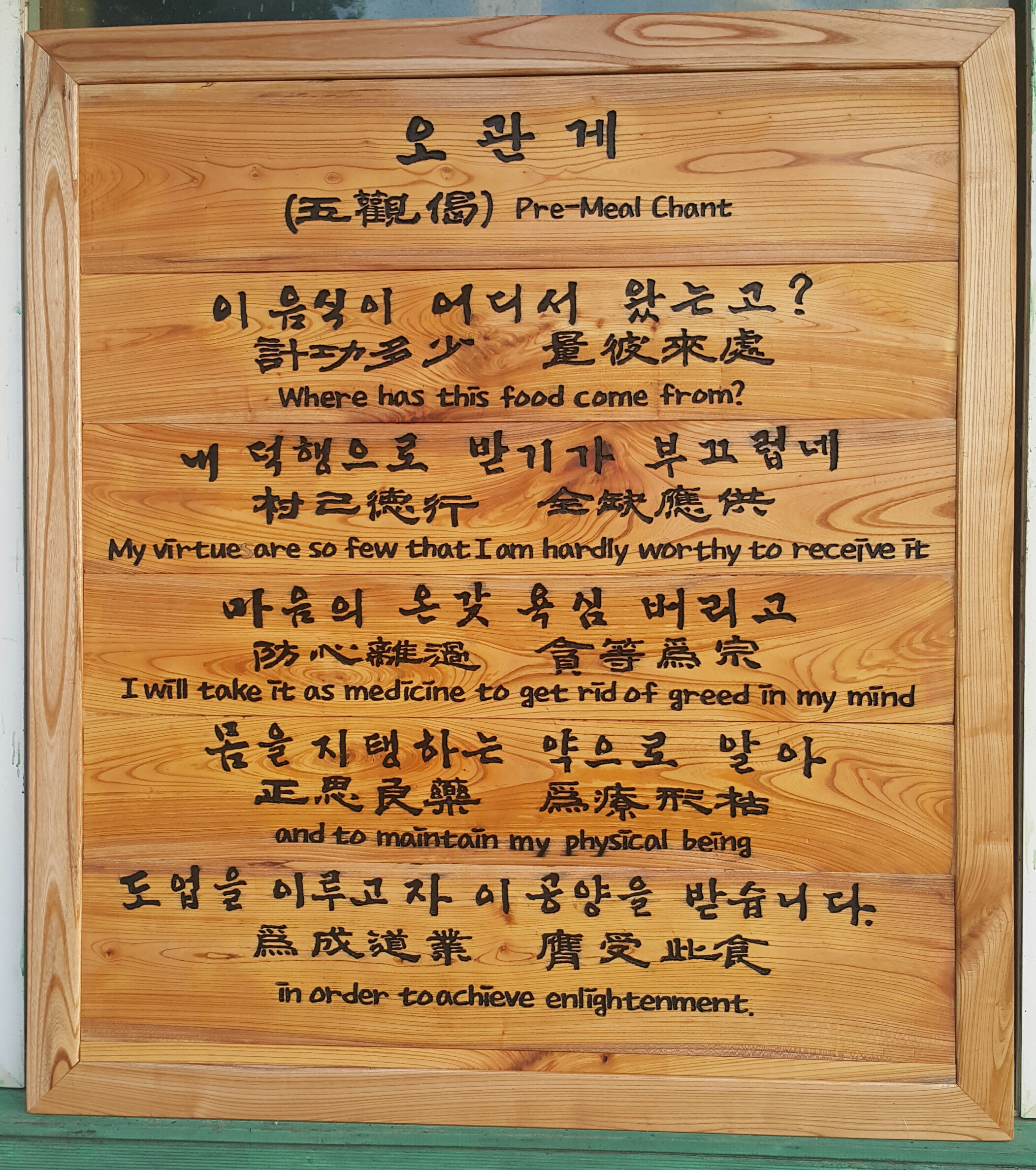작가세계 15/ 전각가 고암 정병례
비움속에서 얻는 신선한 전각화
노자 11장에는 이런 글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꽃혀 있으나 그 바퀴통의 빈 것 때문에 수레의 효용이 있는 것이며,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유(有)로써 이롭게 하는 것은, 무(無)로써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즉 모양이 있는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없는 것, 혹은 모양이 없는 곳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레바퀴의 통, 찰흙으로 만든 그릇, 건축물의 방 등을 들어 소박한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바로 [유(有)]가 [유]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무(無)]를 매개함으로써 비로소 [유]가 [유]일 수 있다는 노자의 철학적 진리를 말한 것이다.
고암(古岩) 정병례(鄭昞例) 선생은 30년 가까이 돌과 전각도를 벗삼아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전각가이다. 그는 방촌의 인장을 확대하여 대형 설치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을 인면에 도입하여 오방색의 화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문자를 새긴다는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대 우리의 역사속에 나오는 온갖 문양이나 그림들을 돌 위에 재현해내고 있다. 그는 항상 잡다한 고정관념들을 비워내기 때문에 상큼한 아이디어들이 샘물처럼 넘쳐흐르게 한다. 비움의 미학! 그가 추구해 온 전각의 길을 반추해보면서 우리는 그의 비움에 대한 생각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김질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연마
고암선생은 전남 나주군 동강면에서 자연과 더불어 뒹굴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유난히 자연미를 중시하는 작품관은 유년시절의 환경탓인지도 모른다. 농가의 들일을 도와주는 사이에 서당에 나가 글을 읽기도 하였다. 스무살을 넘기면서 군임무를 마치자 인장을 새기는 일을 하게된다. 더없는 새김질에 대한 동경과 열정은 전각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나갔다. 인재에 문자를 새긴다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인지라 시간가는줄 모르고 매료되었다. 10여년 전각을 독학하면서 <전각자림>이라는 사전도 구하고 갖고 싶던 몇 권의 책도 입수하게 되었다. 인사동에 출입하면서 서예를 공부해야한다는 자각이 들어 부평의 동곡 김재화선생에게서 5년여 동안 오체를 익혔다. 그러는 한편 판화와 공예에도 관심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문자를 새기고 그것을 찍어내는 방식이 판화와 조각과는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자를 익숙하게 새겨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파 놓은 음양각의 맛을 독학으로는 제대로 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83년 회정(懷亭) 정문경(鄭文卿) 선생으로부터 본격적인 각법(刻法)을 전수받기 시작했다. 한나라의 음각을 모각하고 만백인(滿白印)을 익혀나갔고, 봉니의 구불구불한 획질을 통해 가는 양각획의 묘미를 익혔다. 특히 청대 제백석의 각법은 이후 독자적인 상쾌한 각법을 펼쳐나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 80년대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한인(漢印)을 모각하였고, 이른바 전각3법인 도법(刀法), 장법(章法), 자법(字法)을 수많은 작업을 통해 익혀나갔다. 단순하게 문자를 새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문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김재섭(金在燮)선생에게서 문자학에 관한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80년대 당시 수련할 때의 양식은 작품 <장사운비>(그림 1)를 통해 알 수 있다. 음각으로 획의 끝처리에 신경을 썼다. (그림 2)는 마치 고인을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3)은 주백상간인으로 양각의 호(壺)자는 획의 직선기조를 살려 안정되게 처리하였고, 음각의 중천(中天)은 두 글자가 한 글자처럼 보인다. 80년대는 이와 같이 기초를 튼실하게 다지고 많은 모각을 통해 심미안을 확대해 나가던 시기였다.
전각의 바다에 빠져 몰입하던 시기
날마다 여러방의 인장을 새기면서 전각에 몰두한지 20여년이 된 40대 중반에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1992), 동아미술제 특선(1993)으로 공모전을 마치고, 1994년 고암전각예술원을 개원하였다. 서단에서 서예가와 화가가 여기로 인장 몇 벌을 새기고는 전각가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예단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암전각예술원이라는 독자적인 연구실을 개원한 것이다. 전각은 서예에 예속된 하부예술이 아니라 서예, 문인화와 동등한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각이 대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순수예술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실을 방문해 본 사람은 사방을 가득채운 전각작품들에 놀라게 된다. 그 동안 발표해온 수 많은 돌에 둘러쌓인 연구실 분위기는 이 곳이 작품산생의 산실임을 알게해 준다. 90년대 선생의 작품경향은 고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창신의 변화를 꾸준히 모색해 간다. 94년 발표된 <능정업장(能淨業障)>(그림 4)은 한인의 풍모위에 자신의 개성을 더한 작품이고, <정심행선(淨心行善)>(그림 5)은 제백석의 칼맛에 현대적인 조형미감을 살린 작품이다. 94년 금강경전을 열면서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바를 뚜렷이 보여준다. 5천여자를 방각(그림 6)하고 마음을 모아 돌 위에 새긴 흔적(그림 7)에서 우리는 그의 치열한 작가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의 심화는 98년 발표한 <삼족오(三足烏)>(그림 8)에서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으로 드러난다. 단순한 문자의 표현영역에 갇혀 폐쇄적이었던 전각의 영역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한 가지 색으로만 고정화된 화면도 두 가지 이상의 칼라를 도입하고 화면도 대형화하거나 설치작품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90년대의 작품에서는 고전을 바탕으로 창신을 일궈내고,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험과 파격을 통한 독자적인 세계
2000년 이후 최근의 작품에서는 고암선생의 독자적인 전각작품이 두드러진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민화와 벽화, 길상문양 등 여러 분야의 소재들이 그의 작품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2003년 발표된 <까치와 호랑이>(그림 9)는 민화풍을 사실적이기 보다 관념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작은 화면속에 잘 나타내고 있다. 네 가지 색상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도 최근의 기법에서 나타난 특이점이다.
2000년 <삶, 아름다운 얼굴>이란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는 작가가 선정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31분의 얼굴을 전각작품으로 선보였다. 문인 피천득선생은 “사람은 욕심을 갖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해요. 욕심 때문에 자존심을 꺽고 부정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또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이 서서는 안 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글속에서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은 피천득선생(그림 10)의 인상을 철학적 형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 어느 분야의 예술이 이렇게 표현대상의 심성까지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선생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전각이란 장르에 갇히길 거부하고 다양한 오브제와 각종 재료를 사용한 실험이 이어진다. 2003년 발표한 설치작품 <샘>(그림 11)에서는 바닥에 거울을 깔고 돌위에 십장생을 새겨넣었다. 돌의 배치는 샘[泉]을 연상시키는 둑 형태로 빙 둘러싸 놓았다. 물의 속성은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한 특성을 전각작품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발상이 신선하게 보여진다. 이차원적인 전각기법을 3차원의 공간개념으로 확산시킨 작업이기 때문이다.
2001년 발표한 <동방의 빛>(그림 12)은 ‘전각화(篆刻畵)’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작품이다. 대형아크릴에 전각기법으로 새긴 작품에서 선생의 개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동방문화를 상징하는 몇 개의 엄선된 이미지는 중앙에 있는 반원형의 이미지로 모아진다. 마치 선생의 전각화가 세계를 위해 내달리듯 화려한 색과 힘찬 새김질의 느낌은 다른 용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선생만의 30년 연구성과가 집대성된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전각작품에서 인면(문자가 새겨진 면)에 새긴 문자만을 감상하는데 반해 선생의 최근작품에서는 돌자체를 작품으로 인식하고 방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003년 발표한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何記>(그림 13)는 돌을 공중에 매달고 그 밑에 거울을 두어 인면의 문자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문자가 새겨진 밑면과 동시에 나머지 다섯면도 작품표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작품에서 작가의 서명이나 윗면에 조각을 하던 것을 역시 확대해석한 것이다.
이렇듯이 최근 선생의 작품은 다양한 실험과 모색으로 전각을 하나의 종합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림과 글씨는 기본이고, 설치, 화면확대 등 다양한 표현방식과 끊임없는 실험으로 전각을 한차원 다르게 해석해 내고 있다.
전각의 세계화를 위해서
필자는 고암선생과 대담을 하면서 작품을 대형화하거나 설치작품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선생은 “크기는 가슴속에 있는것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즉 동양적인 상외의 상을 전각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보다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머리가 10%이면 나머지 90%는 열정이 있어야 창조적인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바닥에서 호응을 얻어야 진정한 대중예술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2005년에 해외에서 대규모 전시를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선생은 문하생들에게는 늘 “고법중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피천득선생이 말한 “적법한 균형속에 파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자신만의 전각예술로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고정관념과 과거의 학습에 매달리지 않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왜냐하면 비어있으면 항상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수 (서예세상 지기)
'작가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부드러움으로 이룬 소박한 멋(운곡 김동연 선생의 작품세계) (0) | 2010.12.28 |
|---|---|
| [스크랩] 서예는 화선지 위에 수놓은 정신의 결정체(창석 김창동님의 서예세계) (0) | 2010.12.28 |
| [스크랩] 가슴속에 대나무를 키우는 문인화가/청오 채희규님의 작품세계 (0) | 2010.12.28 |
| [스크랩] 이 모든것은 꿈이다(포헌 황석봉님의 서예세계) (0) | 2010.12.28 |
| [스크랩] 경남서단에 뿌린 문인화 씨앗-운정 조영실님의 문인화 세계- (0) |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