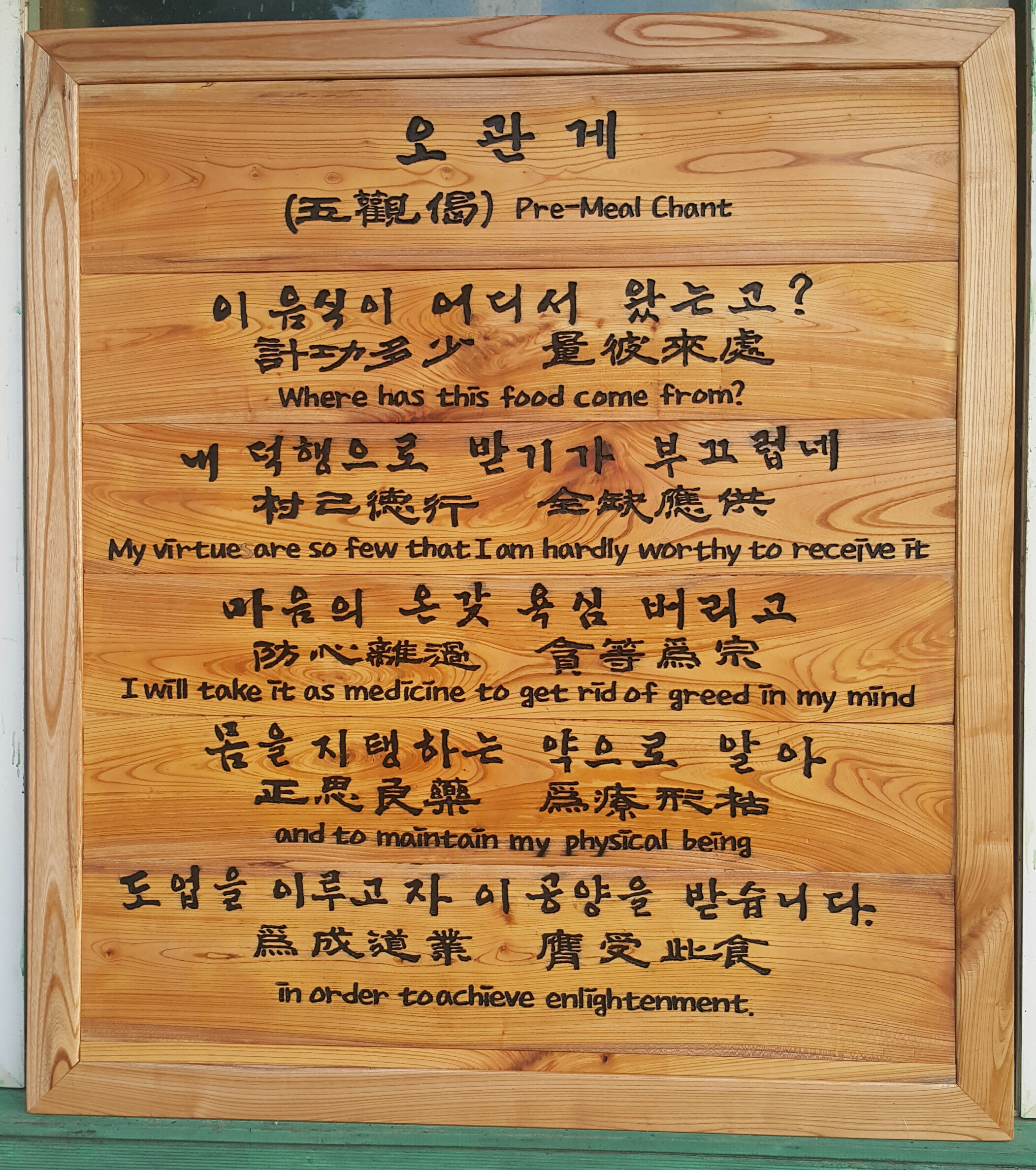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 |
초정만큼 염결한 삶을 산 이도 드물 것이다. 또한 그만큼 시의 도, 예술의 도를 추구한 이도 많지 않을 것이다. 만년에 그가 다다른 곳을 미의 법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지나친 수사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미적 양상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무( 無)라 할 수 있는 시원에 이른 것이다. 그는 그 깊음에서 우러나는 근원의 빛깔[玄]을 보았다. "水深도 모르게 빨려든/저 하늘색 물빛!"('푸른 동공(瞳孔)'에서). "시도 받들면/문자에/매이지 않는다"는 '제기(祭器)'의 한 구절로써 그의 삶과 시가 요약되는 것은 아닐까?
말할 것도 없이 초정의 삶도 파란과 질곡의 시대와 더불어 우여곡절로 점철된다. 하지만 한평생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은 구도자의 자세이다. 시와 예술이 하나의 도로 통하는 것임을 그의 전 생애는 말하고 있다. 일제 시대 고향의 들길을 그리워하는 망명자가 되기도 한 그는,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단의 세월에도 고원(故園)의 꿈을 잃지 않는다. 이후 생활의 곤궁이나 고난 또한 그에겐 더 큰 사랑을 키우는 거름이 되고 만다.
'뜨거운/불길 속에서도/함박눈 쓰고 나오더니//오늘은/이 손바닥 위에/소슬히 솟는 궁궐!//여지껏/광을 내던 金붙이/넝마처럼 뒹굴고 있다.'('착한 마법')
이처럼 불길속에서도 함박눈을 쓰고 나오는 백자처럼 그의 삶은 시대를 자기 연단의 방편으로 삼는다. 세속의 가치들은 그에게 넝마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초정이기에 마침내 미의 법문을 열어 두고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닐까?
초정 김상옥이 작고한 지 올해로 3년에 접어들었다. 일주기를 맞은 2005년 그의 고향 통영에서 마지막 제자인 김보한 시인이 추모 세미나를 열었고 그 이듬해 제자들이 엮은 추모문집이 발간되었다. 그의 전집이 평소 그와 가까웠던 민영 시인에 의해 간행된 것이 작년이다. 곧 그에 대한 연구서가 나온다는 말도 들린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많은 일들이 진행된 셈이다. 그에 대한 경의와 추모의 염이 강렬한 탓이다.
그런데 최근 통영시와 초정 김상옥 기념회로부터 초정 김상옥 시동산 건립 기념식이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한 기념 시비 제막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통영 바다가 보이는 남망산 공원의 한 자리, 그 가운데 초정의 자필 시비 '봉선화'가 세워지고 그 둘레에 그의 시와 글씨와 그림이 새겨진 10개의 돌이 놓인, 시 동산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장소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통영의 힘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통영은 윤이상과 청마와 초정, 김춘수와 박경리와 전혁림을 낳고 기른 곳이다. 풍수설이나 풍토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담한 남녘 항구도시에서 이토록 걸출한 예술가들이 한둘이 아니라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주변의 낙후를 탓하지 않고 이들을 기념하며 자부를 강화하는 지역민들의 정성도 눈부시다.
자주 시비를 건립하는 일이 시비(是非)가 되는 경우를 목격한다. 기려야 할 사람이 아닌데도 무리를 하는 까닭이다. 그러다 보니 마땅한 장소가 아닌 곳에 덩그렇게 외롭게 버려진 시비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고결한 생애를 남기고 빛나는 경지를 보인 이들에 대한 찬사는 통영의 초정 김상옥 시동산처럼 아름답게 표출되는 것이다. 김춘수의 시가 말하듯이 삼월에도 눈이 내리고 바다가 새앙쥐처럼 눈을 뜨는 통영이 그립다. 그의 경해(謦咳)를 접한 많은 문인들이 내주엔 통영으로 모여든다고 한다. 생전의 그를 뵌 적은 없으나 시 예술로써 이미 그를 만났으니 남망산 기슭에서 초정을 기리며 봄 바다에 취하는 것도 좋으리라.
문학평론가·한국해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