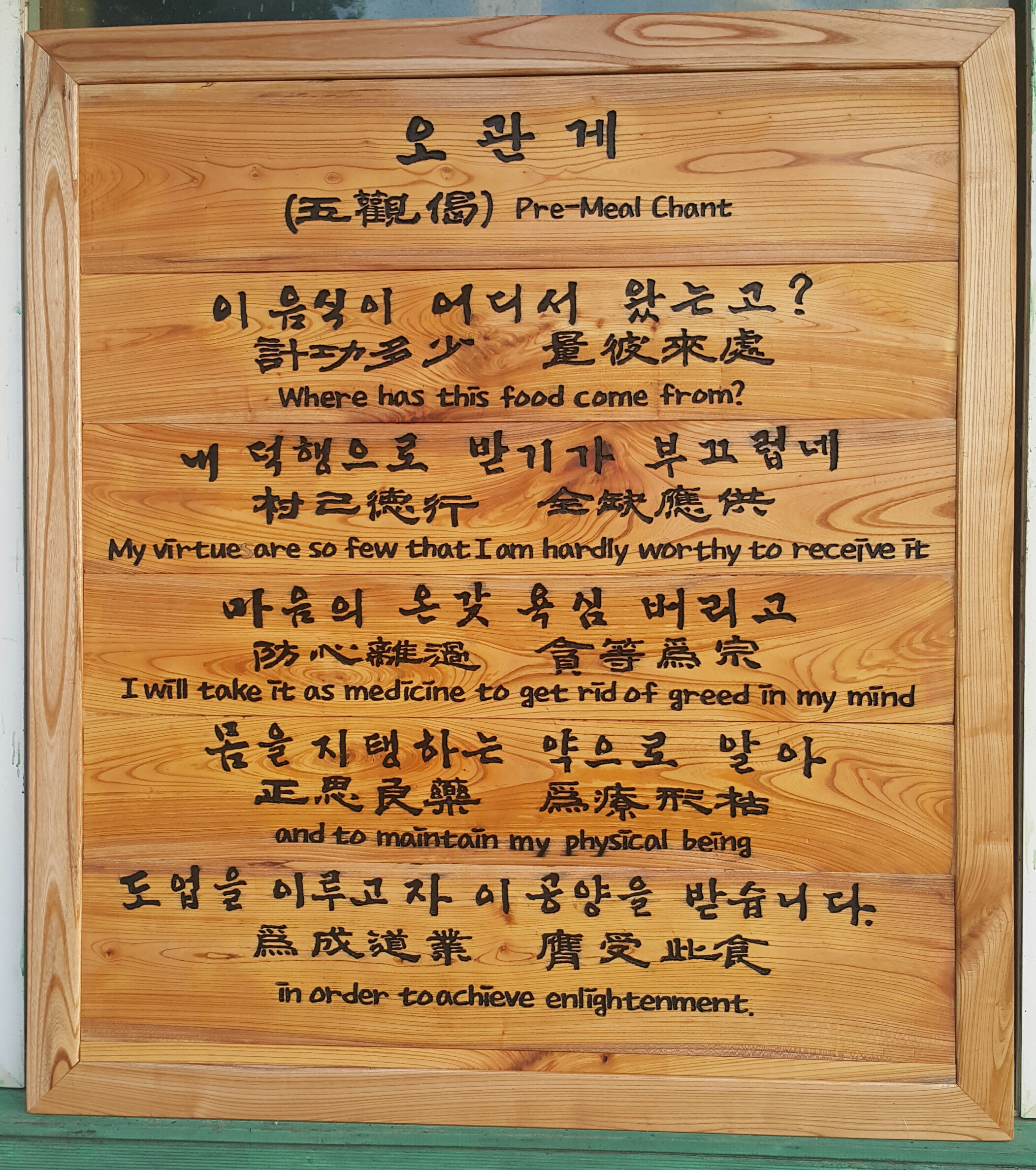낯설지만 자유로운 장소
저한테 서재는 먼 나라의 공항 같은 곳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건 나 뿐이고, 내가 의식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고요. 그리고 궁금하긴 한데, 편안하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은데,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긴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서재는 폐쇄된 공간이면서도, 열려있어요. 마치 나는 볼 수 있고, 밖에서는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창으로 둘러싼 유리방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책을 보고, 지식을 쌓는 곳이라는 느낌보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여기서 나는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나는 순정한 처녀림 같은 데에 막 도착한 프런티어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자유롭고, 또 내가 약간 방치된 느낌도 있고, 낯선 것에 대한 긴장도 좀 있는, 그래서 먼 나라의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서재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재에는 물론 너무나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얼 기준으로 정리해 놓거나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정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 무너지니까. 제 서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편하게 해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자도 제 책상에 앉아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한 의자를 사용하냐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불편한 의자를 일부러 사요. 푹신하지 않고, 좀 딱딱한 의자, 그게 저한테는 편해요.

책을 볼 때는 한 권에만 집중해서 읽는다
저는 제 일생을 통틀어서 초등학생 때가 제일 독서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궁금한 것이 책에 다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대답해 줄 어른이 안 계셨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때는 옛날이고, 또 작은 읍이어서 책이 많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도서관에도 서가가 몇 개 없었는데요. 그 서가에 기대서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가 막 시끄럽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조용하거든요. 그 때 책을 읽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던 그런 때의 기분을 지금도 책 읽을 때 아주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을 해요.
내 소설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소설이라는 게 소설가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나오는 거고, 또 더 크게 보면 사회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회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그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또 소설이니까요. 어떤 소설이든지 저의 현재, 제가 살았던 삶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을 보면, ‘맞아, 내가 이걸 쓸 무렵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다들 다른 식으로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 일? 내가 그 소설 쓸 때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그 소설을 쓸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그거 할 때 나는 무슨 소설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매치를 해요. 어쨌든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의 인생은 행복했고, 어느 시기의 인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다 제 것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설을 써야지 더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쓰고 싶다면 ‘왜’ 쓰고 싶은지 생각해라
저는 늦게라도 소설을 쓰고 싶어하시는 분한테 ‘진짜 소설을 쓰고 싶어?’라고 얘기하곤 해요. 왜 쓰고 싶은지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글짓기를 좋아했고, 문학소녀 시절을 보냈고, 국문학과에 갔고, 거기서도 많은 글도 쓰고 했지만, 그때는 왜 소설가가 못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세상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때만 해도 정답을 맞히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뭐가 주어졌으면 그걸 맞히려고만 했지, 내 식대로 무엇을 보고, 내 식대로 새로 해석해 보고, 내 방식대로 사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나만의 시각이나 관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죠. 물론 글 솜씨를 가지고 뭔가를 써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은 남의 흉내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허영심의 발로였을 뿐이지, 내가 진정 하고 싶고, 궁금하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혹은 지금이라도 (소설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왜 쓰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러면 뭘 쓰고 싶은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책
-
- 꿈을 찍는 사진관
- 강소천 | | 교학사
- <꿈을 찍는 사진관> 반갑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시던 저희 외숙모께서 저한테 전집을 선물해 주셨는데, 여섯 권짜리 강소천 전집이었어요. 제가 책도, 영화도 여러 번 보지를 못하는데 그 책은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서 이 <꿈을 찍는 사진관>, <꽃신을 짓는 사람> 이런 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강소천 동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생활감각, 정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아이취급 하지 않는 아이정서, 그런 게 저한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꿈을 찍는 사진관>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꿈이라는 게 찍힐까?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가슴 설레면서 상상하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강소천 동화, 저의 초등학생 시절을 함께했던 책입니다. 
-
- 김수영 전집
- 김수영 | 민음사
- 그 다음에 저의 청춘 시기에 저를 많이 붙잡아 주고, 때려주었던 책, 김수영 시예요. 김수영 시는 저한테 자기 혐오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삶의 허위나 틀에 대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데, 그런 비아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김수영 시도 실제적인 감각, ‘왜 나는 큰일에는 화를 못 내고 야경꾼에게 분노하는가?’라던지 이런 생활적인 감각, 그리고 자기자신의 더럽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폭로하고 야유하는 그런 태도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