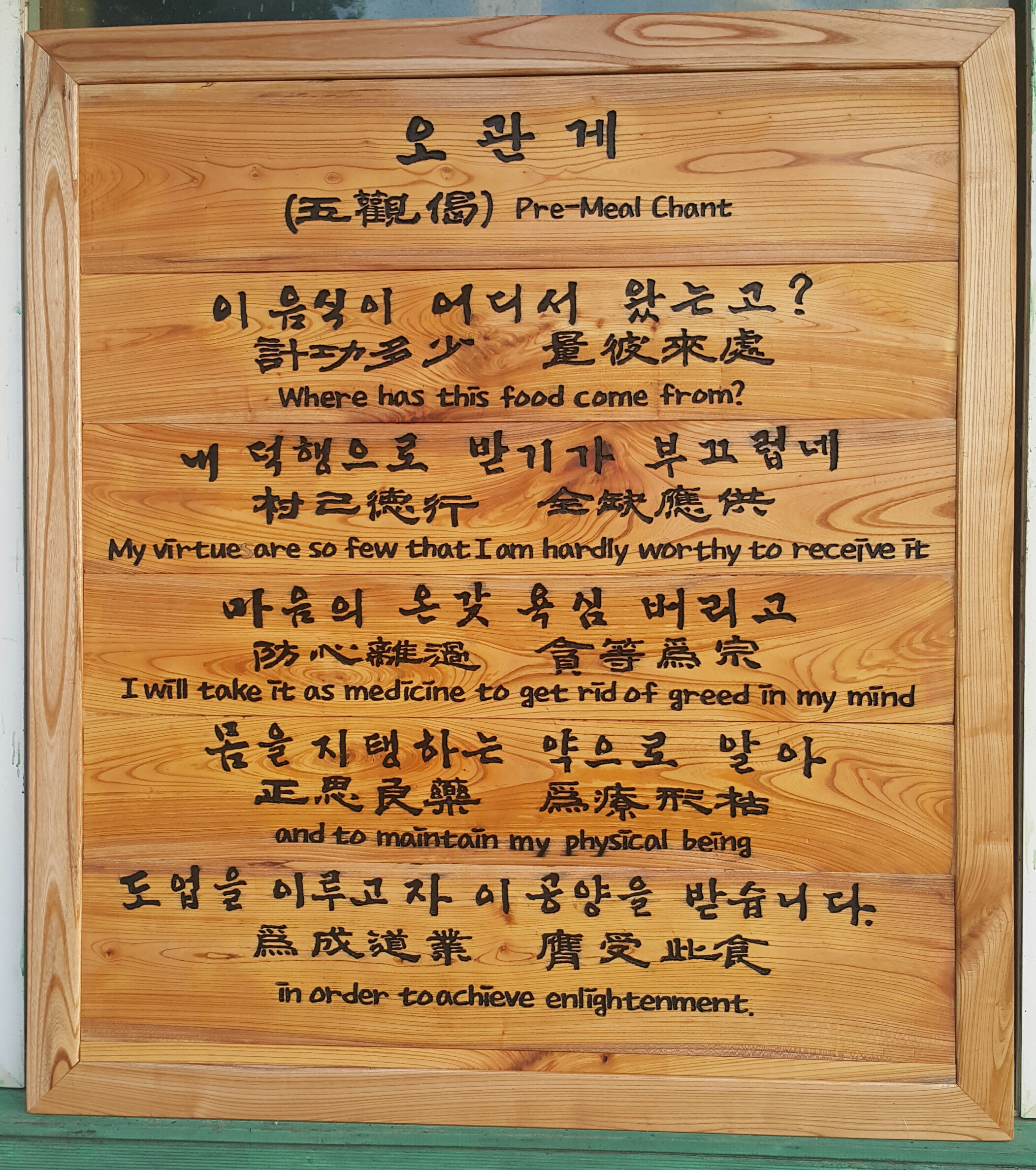벼루에 먹물이 마를 날 없었던 50년 세월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 자락에 자리잡은 공산예원(空山藝院)이라는 서예연구실에는 대구서단의 원로예가인 남석(南石) 이성조(李成祚) 선생이 정정하게 빈 산을 지키듯 은거하고 있다. 선생은 열여덟살 고등학교 재학 때 붓을 잡은 이래로 고희가 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필력을 다져온 한국서단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 말엽부터 시작된 서예가로서의 수행은 스무한살 되던 해에 8회 국전(1959) 입선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예를 지도해 준 청남(菁南) 오제봉(吳濟峯)선생이 내린 “모름지기 서예가를 꿈꾸는 사람은 벼루에 물이 마르게 하면 안된다”는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수행하다 보니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오십년 동안 서예가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32회의 개인전을 열어 프로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선생은 수 많은 전시를 통해 60곡, 36곡 등 대형 병풍을 제작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2007년 10월 23-2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전관 전시에서 선보이는 총 2000여점의 대규모 작품 가운데에서도 168곡의 초대형 병풍이 있어 서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희전을 앞두고 있는 선생을 찾아 지난 반세기 동안 서예가로서의 삶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90년대까지 활발한 작품발표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10여년 동안 서단 활동이 뜸하셨습니다. 저의 반세기 서예수행은 돌이켜보면, 처음 은사이셨던 청남선생께서 내린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벼루에 먹물을 말리지 말라”는 교훈은 미술을 전공한 대학시절, 교육자로서 중등학교에 몸담았던 시절, 친구를 따라 당구, 화투, 바둑을 즐길 때도 항상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죽비소리였지요. 1985년 이 곳 팔공산에 공산예원을 건립한 후 조용히 벼루를 벗삼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밖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어 서단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때 불가에 몸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품에도 불경이 많은데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젊은시절 예술인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삶의 화두를 풀지 못해 한 때 합천 해인사 백련암에 출가해서 성철 큰스님 문하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산사에서 수행하지 않더라도 서예를 통해 도를 구하라는 큰스님의 말씀에 따라 하산하여 또 다른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의 작품 가운데 불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법화경 전칠권 28품 69384자도 이런 발심으로 정성을 모아 썼습니다. 붓을 들었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제작에 몰두했는데 지금부터 7년전부터 이 연구실에서 향불을 피우고 하루도 빼먹지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전체문장의 글자수를 세어서 한 자 두 자 볼펜으로 먼저 배자해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붓으로 직접 썼으니 적어도 서너 번 7만자를 쓴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 작품을 제작하면서 3년 동안 감기몸살 한 번 안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사경을 할 때 흰머리가 빠지고 검은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어느 큰스님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그렇다고도 합디다. 이 작품을 표구하니 168폭이 되었고, 한 폭이 71센치미터에 길이가 약 120미터 정도 됩니다. 표구값으로 지출한 것이 4800만원이고 장석값이 300만원정도 들어갔으니 작품 하나 남겨야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벼루에 먹이 마르면 안된다는 가르침이 떠올라 불가에서 제일 짧으면서 내용이 심오한 반야심경을 초발심으로 다시 서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순셋 되던 때부터 날마다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12~1시까지 4~5시간 동안 반야심경을 썼지요. 컨디션이 좋을때는 3장, 나쁠때는 2장을 썼습니다. 5년동안 1800번쯤 썼고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절집에 출가해 공덕을 쌓지 않더라도 서예를 통해 나름대로 도를 실천한다고나 할까요. 세간에서 눈을 감고 휘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라도 있는지요. 호사가들의 말일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반야심경을 열심히 휘호하던 예순일곱 되던 해 어느 날 출입하는 문도들과 어느 절에 갔는데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하더군요. 남의 눈에는 피가 보였는데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군요. 의학용어로 망막박리라고 하는데 눈알이 박리가 되어 레이저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눈 수술 후 일년동안 붓을 잡을 수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생애 가장 오랫동안 벼루에 먹물이 마르게 한 시기였지요. 이듬해 예순여덟이 되자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시력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동안 익힌 필법으로 휘호하였는데 세간에서는 눈을 감고 글씨를 쓴다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도 붓과 먹에 취하다보면 저절로 글씨는 되는게 아니겠어요. 왼쪽은 보이지만 오른쪽은 희미하니 눈을 감고 쓴 것이나 다름 없었지요. 암중취호(暗中醉豪; 눈이 어두운 가운데 붓에 취함)라고나 할까요. 오히려 문자를 이쁘게 꾸미려는 의도가 사라지게 되더군요.(실제 필자의 앞에서 눈을 감고 휘호해 보이면서 자연스럽고 과도한 수식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부터 30미터 되는 피지 210개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 열 개도 남지 않았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개 정도 소모한 셈이지요. 즉 신비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의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연스러운 글씨를 쓰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고희전에 출품되는 작품은 어느 정도 분량이고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예순여덟이 될 때 서예인생 반세기를 돌아보는 행사를 하려다 취소하고 입문한 지 52년째인 금년에 고희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인전은 33회째인데 타이틀을 <불망지제현(不忘之諸賢); 잊지 못하는 여러 어진이들>이라고 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인연을 맺으면서 함께 해 온 여러 분들을 잊지 못한다는 소망으로 그 분들에게 한 작품씩 저의 졸작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685분에게 감사의 뜻을 모아 전하는 기증작품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묘법연화경(법화경) 전7권 전문을 병풍으로 만든 168곡병과, 은사인 청남 선생, 시암 배길기선생, 성철 큰스님, 설송 큰스님 등과 문중제자 들을 위한 작품, 신,구작 병풍 가운데 보현행원품 60곡병, 국내작가 합작병풍 20곡병, 도연명 시 10곡병, 금강경 10곡병 등입니다. 거기에 20대부터 발표해 온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으다보니 총 2000여점이 되어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전관을 빌려서 대형 전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철없던 고등학교 삼학년 시절에 큰 선생님이신 청남 오제봉 선생을 만나 서예가로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발표되는 신작 1800여점 가운데 반야심경 108점, 반야심경 액자 1080점, 기념품 붓통이 10800점으로 108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108배는 불가에서 중생의 번뇌 수효가 108개라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번뇌의 수를 많이 잡으면 8만 4천 번뇌이고, 적게 잡으면 3독 등 다양하지만,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108 번뇌이지요. 108번 절하면서 번뇌를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심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서단의 원로로서 요즘 작가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단보다 모든 예술인들에게 당신은 “예술을 빙자한 생활인은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본인에게도 늘 반문해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예가는 다른 예술가와는 다릅니다.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비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文行幷重]. 그래야 고아한 예술품이 나오지요. 저의 스승이셨던 청남선생은 “사람되면 글씨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와서 새삼 되새겨 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서예모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임에 정신이 팔리면 정신이 멍들게 되고, 정신이 멍들면 표출된 작품도 예술품이 아니고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어 시간을 뺏기지 말고 작업실에서 땀을 흘려야 해요. 벼루에 먹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예가가라고 자부할 수 있지요. 이제까지 공부해온 장르나 심취했던 서풍은 어떤 것들이 있고 최근의 서풍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서예에 입문했을 때 청남선생이 쓰시던 안진경의 해서, 황산곡의 행서를 주로 임서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운여 김광업 선생의 서풍도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서예인생에서 중요한 스승 한분은 스물여섯에 만난 시암 배길기선생입니다. 국전에 입선을 몇 번 하면서 시암선생은 늘 전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요. 전서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예의 뿌리는 전서라고 하셨지요. 시암선생의 문하에서 전서 <석고문>. 예서는 <조전비>, <장천비> 등을 썼습니다. 국전 출품도 주로 전서로 하게되었는데 전서로 입특선을 하였고, 마지막 입선작은 창작인전을 출품하였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영향인지 저는 대전(大篆)의 회화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50대 초반까지 전서와 예서풍의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서와 예서작품이 거의 없었는데 향토서단에 전서와 예서풍을 대중화 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 있어 특정서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붓만 잡으면 해서, 행서, 전서, 예서 등 저절로 섞여 나옵니다. 어느 정도 득력을 하면 한글이든 한문이든 예서든 전서든 상관없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문자는 점과 선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떤 서체든 구분지을 필요없이 50여년 열심히 하다보면 스스로 변한다고 생각을 안해도 저절로 여러 가지 서체가 섞여나와 자신도 모르게 글씨꼴이 변하더군요. 크게 세 가지로 최근 저의 글씨유형들을 나누면, 눈뜨고 쓴 글씨, 눈을 안뜨고 쓴 글씨, 막대기에 붓을 끼운 글씨로 나눌 수 있어요. 눈을 뜨고 자간과 행간을 살피면서 쓴 글씨는 장법도 정연하고, 눈을 감고 쓴 글씨는 시력이 약화된 이후로 시도한 암중휘호이고, 막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눈감든 눈을 뜨든 손가락 아니면 팔목을 사용하여 재주를 부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하고자 막대기에 붓을 끼워 휘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추사나 해강, 중국의 이병수도 손을 사용하지 않은 획과 거꾸로 휘호한 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붓과 다른 특수한 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제 옆에 있던 추사작품집을 펼쳐보이면서 한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휘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획의 수필부분에 나타난 흔적으로 지적해 보였다) 나이 일흔이 되니 겨우 이런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선인들의 작품 가운데 보통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쉽게 함부로 이야기 해선 안될듯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것은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글씨보다 더 자연스러운 글씨를 써보려는 생각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평소 종교관이나 작품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공(空)으로 왔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불가에서 공은 연기설(緣起說)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내가 여기 존재하기까지 많은 원인들이 있었으며, 나도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다름 없겠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제가 있고, 그제가 있어서 비로소 오늘이 있게 된 것이겠지요. 결국 ‘나’라는 존재도 아비로부터 이어지니 현재 이곳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으며, 그러므로 나 자신 또한 공(空)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한 공사상을 작품으로 발표한 적이 많고, 제가 거처하는 연구실도 공자를 넣어 공산(空山)으로 하였습니다. 비우고 나면 아무것도 욕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관이라기 보다 제가 생각하는 서예는 “마음의 그림이요. 인격의 자기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붓끝으로 나타낸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 즉 학식, 교양 등 총제적인 면을 대변한다는 내용)이지요. 도인이 쓰면 도필(道筆)이 아니겠어요. 서예인은 수평적 사고나 수직적 사고를 하지말고 둥근 원상적 사고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둥근 시계처럼 원을 그리면 시계방향으로 처음 익숙하게 못쓴 글씨단계가 악필이고, 그 다음이 졸필, 그다음이 달필, 그 다음이 능필, 그 다음이 명필, 그 다음이 신필이고 마지막 한 군데 남은 것이 도필이지요. 글쎄요. 현재 저는 능필단계에 도달했을까요. 한석봉은 명필이고, 추사는 신필단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마음자세로 오늘도 벼루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서예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담(정태수:서예세상 카페지기)
|
'작가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묵향 차향 음향이 빚어낸 삼중주의 여운(학천 김시형님의 문인화) (0) | 2010.12.28 |
|---|---|
| [스크랩] 김주익 - 그의 작품에서 시간의 궤적을 찾다 (0) | 2010.12.28 |
| [스크랩] 서예가 雅石 蘇秉順(66) 선생을 찾아서 (0) | 2010.12.28 |
| [스크랩] 박생광, 샤갈과의 만남...생전의 꿈 이루다 (0) | 2010.12.28 |
| [스크랩] 석문명에서 우려낸 소박한 멋(서예가 이장환님의 작품전을 보고) (0) |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