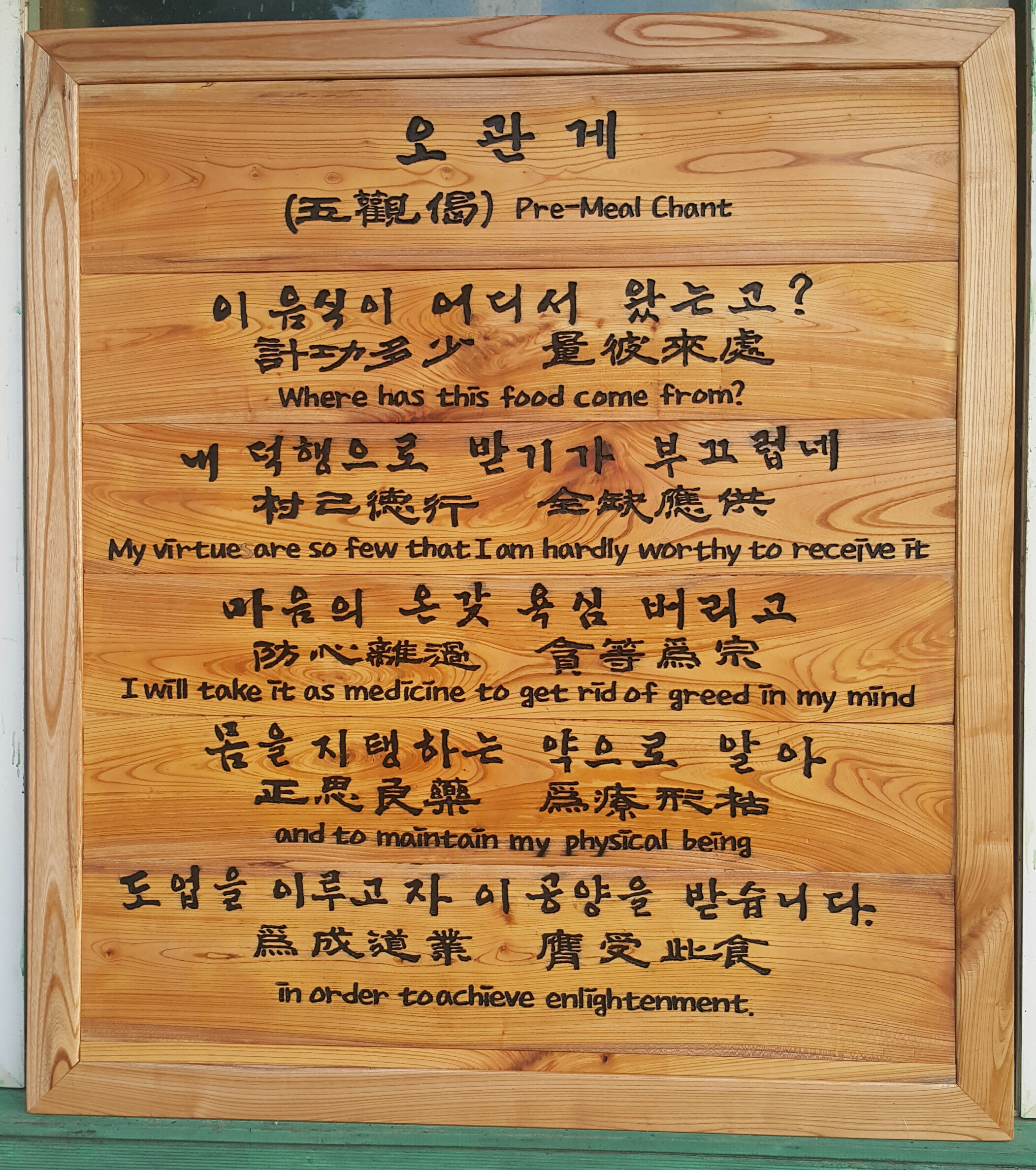일시 : 2007년 4월 3일(화) ~4월 8일(일)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1층 1,2,3 전시실
두목시 <청명> <생> <석고> <춘송> <통>
청봉 이정택
醜의 서예미학을 생각하며 -청봉 이정택 도아전에 부쳐- 4회 개인전을 여는 청봉이 ‘도아(塗鴉)전’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도아(塗鴉)란 종이 위에 먹을 칠하여 새까맣게 되거나 자신의 글씨가 서투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번 전시는 지난번 ‘문자와의 대화전’이라는 3회 전시 보다 작가의 내면세계가 더 진솔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굳이 도아(塗鴉)라고 부제를 붙인 것은 정상적인 문자의 결구에서 이지러지거나 신명이 더 드러난 기이한 작품들을 도전적으로 펼쳐보이면서 겸사로 한 말인듯 싶다.
미학에서 말하는 미적범주에 추(醜)라는 개념이 있다. 추는 미(美)의 대립개념으로서 미적 규범에 어긋나며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반미적(反美的)인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고전적인 예술은 추와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먼 미(美)를 추구하는 편이고, 현대의 실존주의 문예나 예술형식에서는 추를 수용하면서 미적범주의 하나로 넣고 있다.
우리는 서예작품이면 의당 고아하고 교훈적인 내용에 중국법첩에 있는 결구형식을 수용해야 좋은작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변화를 거부하는 고정관념의 우산아래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법첩에 준하는 결구형식과 장법, 그리고 기초적인 점획을 서사할 수 있는 운필정도를 보여주는 전시라면 이미 수십년 서예를 연마해왔고 3번이나 개인전을 연 청봉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에서는 점획의 공간을 파격적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기존의 장법에서 볼 수 없는 공간 운영을 하기도 하며, 문자를 뒤집거나, 먹의 농담을 극대화하여 한 작품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먹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보기에 따라서는 반서예미적인 추의 서예미학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의 양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 형태로 갈래지워진다. <生>이라는 작품에서는 하루 하루 우리의 삶은 남에게 매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마치 그림처럼 도상화 시켜놓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이 그림문자화 되어 움직이는 듯하다. 서예와 회화와의 접목을 시도한 작품인데 이런류의 작품들이 몇 작품 새롭게 선보여지고 있다. <通>이라는 작품에서는 담묵으로 한 글자를 길게 드리워 쓰고 좌측공간을 텅 비워 놓았다. 세상사 하나로 통한다는 일이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나 할까. 이런 일자서형식도 몇 작품 보인다. <古釋>이라는 작품에서는 글자 그대로 옛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작가나름의 조형미감으로 풀어내고 있다. 고정적인 점획배치에서 한걸음 나아간 결구가 재미있어 보인다. 이렇게 결구나 장법의 변화를 모색한 작품들이 여러 점이다. <興詩>라는 작품에서는 시의 느낌에 절로 감흥된듯 興자를 농묵으로, 詩자를 담묵으로 겹쳐서 휘호해 농묵과 담묵의 이중주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렇게 먹의 농담변화를 모색한 작품들도 몇 점이 산견된다. 문인화가 아닌 서예작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먹으로 작가의 심상을 전하는 것도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전통적인 행초서에 작가의 기운과 조형의식을 넣어 맛깔스럽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두목 시 <山行>과 <淸明>을 대련형식으로 꾸민 작품을 보면 청봉의 필사역량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겨울 눈이 내린 산억덕을 아래로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스키어를 연상케하는 상쾌함이 감도는 작품들이다.
아름다움의 뒷면에는 추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추한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꾸며진 아름다움 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눈길을 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의 미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봉의 작품은 점획의 공간을 일정하게 배치하고, 心正筆正이라는 격언을 강조하는 교양차원이나 교육차원의 서예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사유하는 바를 문자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한다. 서예나 서법속에 갇힌 고정화된 패턴을 무너뜨리고 회화와 섭합을 꾀하기도 하고, 고전적인 텍스트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변형된 문자형태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문자속에 전각의 기법을 도입하여 소소밀밀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런 실험이 바로 청봉식 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늦은밤 그의 서실 墨仙齋에 가면 먹향에 취해 붓질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해맑은 눈빛과 따뜻한 손으로 보이차를 우려낸다. 늘 차향과 먹향에 취해 살면서 고전을 뛰어넘고자 하는 파아란 가슴을 지녔기에 한국서단의 푸른 봉우리로 우뚝 솟아 오를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정태수(한국서예사연구소장, 서예세상 카페지기)
|
'작가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한국 전각의 아름다움을 위해 분투하는 예술가 1 (0) | 2010.12.28 |
|---|---|
| [스크랩]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서벽(書癖) 하석(何石) 박원규(朴元圭) 선생 묵연전(墨緣展) (0) | 2010.12.28 |
| [스크랩] 내고외신의 세계(석송 이종호 서예전에 부쳐) (0) | 2010.12.28 |
| [스크랩] 월정 정주상선생의 서예세계 (0) | 2010.12.28 |
| [스크랩] 一中 金忠顯 先生의 삶과 藝術--長巖(장암) 李坤淳(이곤순) (0) |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