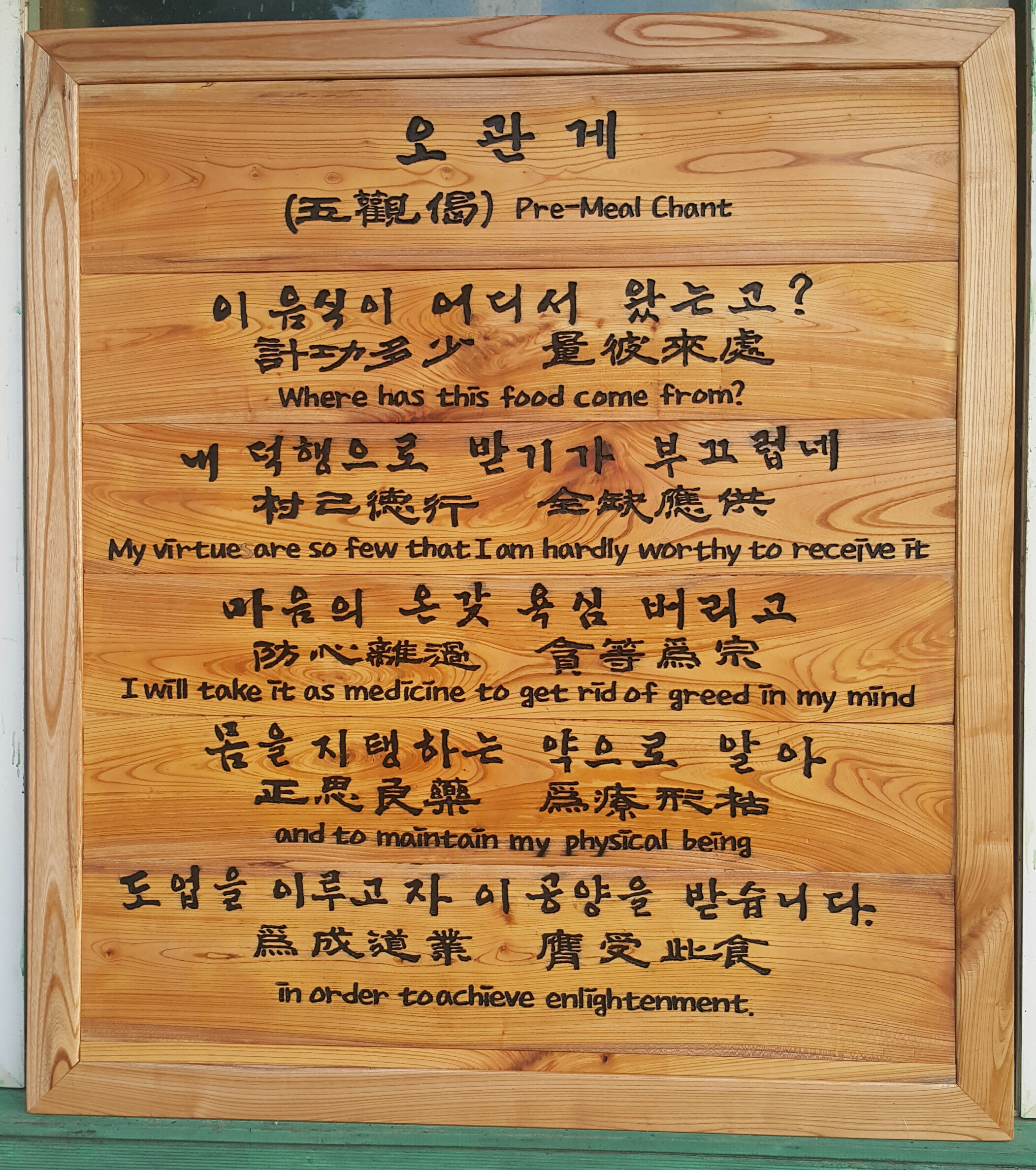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
月汀先生의 『書藝60년』은
여느 서가들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 특이점을 들어보면, 特定人과의 師承이 없이 獨學으로 一貫하여 成家하였다는 것이 그 첫째요, 서예 교육에 直間接으로 從事하면서 半世紀에 걸쳐 서예교과서를 계속 집필하였을 뿐 아니라, 서학도들의 임서력을 기르기 위한 '임서교실시리즈' 20책을 편저하는 등 왕성한 저작 활동이 그 둘째이다. 그리고 70년대 초 쇠퇴일로의 우리 서예를 진흥시키고자 한국 최초로 서예잡지를 창간하였으며, 그것도 月刊으로 5년여 동안 지속함으로써 서예 부흥의 촉진제 구실을 하였음은 우리 서예사에 특필할만한 커다란 공적으로 꼽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다. 선생은 공모전에 超然하여 群鷄一鶴과 같은 참 선비의 모습으로 서단에서 처세하며, 個性味 강한 書風을 빚어내어 獨樹一幟, 한국서단 만이 아니고 국제서단의 頂上에 올랐음도 月汀書藝의 특질이라 할 것이다.
선생은 당신이 걸어온 서예의 길을 '가시밭길'이었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 저명한 스승을 모시고 서법을 옳게 익히며 고매한 인격에 감화되는 배움의 길을 비단길이라고 한다면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길은 가시밭길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선생의 그'가시밭길'을 갈래를 잡아 살펴보기로 한다.
〈가시밭길의 초입〉
보통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체력이 달려서 농업학교에의 진학에 실패한다. 설상가상으로 병을 얻어 부득이 학업을 접어야만 했다. 그리고는 두어 해 동안 병마와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 틈틈이 家學으로 한문도 배우고 글씨 연습도 했지만 건강치 못한지라 건성일 수밖에 없었다고 겸손해 하신다. 건강이 회복되는 성 싶자 선생께서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상경, 그간의 공백을 만회하려는 일념으로 속성학원에서 강행군을 하게되는데, 마침 새로 개교한 조선무선통신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적성이 맞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무선통신사 3급의 국제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好事多魔, 육상무선국에의 취직자리는 조선인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 기선이나 항공기의 통신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서 차선책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는 있었지만 완고한 부친의 허락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1942년 3월이었다. 하릴없이 빈둥거리고 있는데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가 찾아왔다. 교원시험을 보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참고가 될만한 책들도 갖다주었다. 공부를 시작한지 석 달 후에 치른 시험에 합격하였고, 다시 넉 달 후에 교원 발령을 받고서는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모르스(Morse)부호를 두들기던 손에 분필이 쥐어진 것이다. 선생의 서예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셈이다.
햇병아리 교원 시절을 선생은 이렇게 회고했다.
방과후면 풍금 연습을 해야만 했고, 교수법과 교재 연구도 등한히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뭔가 특기가 한 가지는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서예공부였다고 한다.
취학전의 고사리 손에 쥐어 졌던 '회갑 지난 몽당붓(文集)' 그 실물이 지금도 선생의 筆架에 매달려 있고, 5학년 때 통지표에 'き方(습자)' 성적이 九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생은 어려서부터 필재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없는 독습의 길은 당신의 표현대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서예잡지를 받아보고, 법첩을 구하여 쓰고 또 쓰고….
잡지의 경서(競書)에 성적이 다달이 향상되니 재미도 있었거니와 중등학교 서예 교사 등용문인 문검(文部省檢定試驗)제도가 있음을 알고 부터는 그것을 목표로 一路邁進 하게된다. 선생의 서품이 향암(鄕暗)의 속서(俗書)로 흐르지 않았음은 문검을 지향한 글씨수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생은 자평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한글글씨의 벽에 부딛치게 되었다. 선생은 재빨리 보통학교 때 공부했던 습자교과서를 찾아내어 익히기 시작하였다. '오동롱장 화류문갑'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등 궁체를 바탕으로 써 놓은 체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오르내리며 고서점에서 궁체 필사본을 구하여 공부하는 한편 이미 출판되었던 김충현과 이각경 자매의 글씨본 등으로 힘을 얻어나갔다.

〈교과서의 저자로〉
1947년 직장을 대전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로 옮기면서 학교의 특성상 서예 교육을 강조해야할 필요 때문에 선생의 명성이 지역 사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주변의 권유에 힘입어 서예교과서인 '글씨본' 을 저작했던 것이 다행히도 문교부 검인정에 통과되어 저자로서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뒷날, 선생은 당시를 회고하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만용이었노라고 하였는데, 20대 초반의 일이었으니 사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1965년에 중학교 서예교과서를, 1968년엔 고등학교교과서를 저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하면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다.
그 사이에 1968년에는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쓰기' 교과서의 필자로 선임되어 초등학교1~6학년까지의 경필서사체를 보였고, 1994년에는 문화공보부의 위촉으로 '한글쓰기 글자본 정자?흘림 경필서체 5000자를 씀으로써 공용서사체가 선생에 의하여 확정된 셈이다.

〈한국초유의 서예 전문잡지 창간〉
6•25를 겪고, 5•16을 거쳐 사회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나 서예계는 여전히 凍土의 땅 겨울황무지 그 자체였다.
1973년 7월에 선생은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기' 로 어려운 작정을 하였다. 서예 전문지를 창간한 것이다. 그것도 월간으로.
선생은 그간에 출판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잡지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모험인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쇠퇴일로의 서예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의 결단이었다. 여기에는 동도(同道)의 竹史 朴忠植씨가 도화선이었다. 그는,'우리나라도 이제 서예잡지가 있어야 할 때가되었고 잡지를 할 사람은 월정 밖에 없다'라고 못 박으며 등록증은 자기가 얻어내겠으니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 아닌 재촉을 하는 것이었다.
선생에게는 그때 수중에 겨우 500만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상업성이 없는 잡지이고 보면 생활비는 교과서의 인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언제나 가족에게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노라고 했다.
어떻든 잡지는 등록이 되었고, 창간호를 꾸미느라 8월의 더위를 땀흘리며 견뎌야만 했다.
100쪽 미만의 얄팍한 잡지였지만 혼자 손으로 만들기엔 벅찬 일이었다. 취재하랴, 원고 쓰랴, 외고 청탁하랴, 인쇄소 뛰어다니며 교정보랴. 사원을 쓰자니 월급을 줄 형편도 못되려니와, 젊은이들은 한자와 서예 용어를 모르니 교정을 맡길 수도 없고, 그야말로 북 치고 장구 치고 징 치고 꽹과리 치고 1인 4역 5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서예 잡지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글씨공부'란 쳇 줄 받아서 보고 쓰는 것으로 시종 하였지 법첩이란 용어조차도 일반인에게는 귀 설은 말이었고, 이론에의 접근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잡지의 성격을 '서예 인구의 저변확대'에 두었다. 따라서 주요 법첩의 소개, 서법 기초의 해설, 서예사의 연재 등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서제도를 마련하여 실기의 수련 의욕을 고취하였다. 이 경서제도는 실로 획기적인 시도였다. 쉽고 간단한 것에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배열해 나가는 경서 과제의 선정과 그 도해?설명, 급수 사정의 평가와 간단한 평어(評語)등을 곁들인 도판화(圖版化)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독자들의 호응에 고무되어 즐겁게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교양을 위하여 문인,학자들의 글을 매호마다 몇 편씩 실어 얇지만 알찬 잡지를 꾸미려 애를 썼음도 역력히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두 가지의 다른 서예지가 등록되었는데 한 가지는 계간(季刊)일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난삽한 잡지였고, 다른 하나는 월간이기는 하였지만 편집의 방향이 달라서 둘 다 경쟁의 상대는 아니었다.
잡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위치가 不偏不黨하였기 때문에 정론을 펼 수가 있었고 서예계나 서단의 문제점을 명쾌한 필봉으로 그 시시비비를 가려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잡지는 독자들의 호응 속에 호를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에는 전국의 서예지 애독자들의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성과는 1976년 6월 신문회관에서 처음으로 '月刊書藝誌友展'이라는 전국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예계의 눈길을 끌었으며 1979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회우들이 '玄素會'라는 이름으로 서울 동덕미술관에서 발표 전을 가진바 있다. 전자나 후자가 모두 서예지 영향하의 전시회였고 선생은 작품지도는 하되 개성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신선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중평이었다.
그렇기는 했지만 油類波動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제작비 마련이 어려워 달을 건너뛰기도 하면서 5년여를 버티다가 통권 38호를 끝으로 폐간의 고배를 들고 말았다. 이때 선생의 아픔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선생은 주저앉지 않았다. 독습자를 위한 '임서교실'을 시리즈로 저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월간 서예지를 유일한 길라잡이로 삼아 공부에 재미를 붙여오던 독습자들의 목말라하는 소리를 울 너머의 소리로만 듣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들이 일찍이 시도하지 않던 큰 판형으로 글자를 키우고 그것을 가주(加朱?圖解)하고 설명을 곁들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히트의 연속으로 중판을 거듭하여 2002년에는 20책 1질의 完刊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선생의 남다른 '서예사랑'은 이렇듯 꺼질 줄 모르는 횃불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단에의 진출〉
잡지를 내기 시작하면서도 선생은 스스로 서가로 자처하지도 않았으려니와 서단에서도 서예가 대접(?)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예교과서를 쓰고 있는 사람' 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은 작품으로서의 글씨를 세상에 보인 적이 없었다. 공모전에는 물론이고 대소 어느 서예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니 단체전에 끼일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공부가 공모전(당시는 국전)에 내어 봄직 하다고 짐작되었을 때에는 이미 심사비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때라 아예 외면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첩의 臨模, 서론연구, 작품의 습작을 꾸준히 하고 있던 터라 1975년 4월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펼쳤다.
그 도록에'寸辯'이라 題한 코멘트 말미에 '末節의 技에 陶醉되거나 好奇의 客氣따위를 自戒하면서 法古의 바탕 위에 自我를 구축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다짐해본다'라고 결의를 피력하였는데, 각 체 대소작 53점을 선보인 이 전시회를 두고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신선미를 보여주었다'는 세평이었고, 어느 기자는 '이 나라에서는 어려운 처세'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 말은 공모전에 초연하고 서예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외톨이임을 지적한 것으로 짐작된다. KBS 라디오에서는 한낮의 시간에 생방송으로 10분 넘게 전시장을 스케치하면서 현장인터뷰를 통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이 1회전의 작품성을 총평하자면 劃質은 맑고 강하며 운필은 자유롭고 탈속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1회전에서 힘을 얻은 선생은 그 후 3년만인 1977년에 서울 미도파화랑에서 제2회전을 갖는다.'洗心'을 비롯하여 43점을 출품하였는데 1회 때 육조풍의 주경(?勁)한 서품과는 달리 많이 부드러워진 溫潤한 행서위주의 작품들이었다.
그로부터 3년만인 1980년 2월에 국제서도연맹 국제 본부의 초청으로 曉楠 朴秉圭 선생과 2인 전을 일본 동경에서 가졌다. 이때 해외 여행이 처음인 선생은 여권 수속을 하면서 재야작가였기에 수모를 당하였노라고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곤 한다. 당시에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화공보부의 인정이 있어야만 여권 심사에 통과가 되게 마련이었는데 '당신은 국전작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진부한 관료의식의 횡포 앞에 곤욕을 치르고 가까스로 개막 시간에 대어갈 수는 있었지만 재야작가의 설움을 톡톡히 맛본 셈이었다.
이 2인 전에는 각각 15점씩을 출품하였는데, 선생은 우리나라 애국가 첫 절을 써서 그 속에 끼웠다. 일황의 궁성 앞인 '마루노우찌(丸の內)'에서 3월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라는 것을 의식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폐막 전날 어느 재일 동포 실업가가 그 애국가 작품을 양도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글은 물론이고, 우리말도 통하기 어려운 교포 2세였는데'애국가'라니까 꼭 간직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선생은 감동하여 흔쾌히 기증하기로 했다. 그런데 끝나는 날 그는 적지 않은 액수의 사례금을 접수처에 놓고 갔더라는 사실도 그냥 예사로운 일화일수 없다. 나머지 14점은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 보고 전을 겸하여 제3회전을 서울 롯데백화점화랑에서 펼쳤다.'龍翔鳳舞' 외 33점의 행?초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는 당신 소장의 고려전(高麗?)을 수탑(手榻)한 문지(紋紙)위에 4언 대련을 쓴 것이라든지, 구긴 종이에 거칠은 필획을 노린 작품 등으로 창작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도록의 머리말에서 '정통으로 수업한 튼튼한 바탕 위에 개성적인 자기를 구축하여 일가의 역에 든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준엄한 자아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는 왕성한 창작의욕의 소유자로서 부단히 품성의 도야에 힘쓰고 학덕을 쌓아 가는 그러한 서가'를 이상으로 삼고 '法古而創新 能典而知變'을 旗幟로 하며 수업하고 있노라고 創作意志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로부터 다시 4년만인 1984년 4월에 선생은 네 번째의 발표 전을 펼쳤다. 서울 동덕미술관에서의 4회전에는 '尺璧非寶'외 56점을 선보였다. 그 붓끝은 무르익기 시작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휘두른 붓 자취가 보인다. 몇 작품은 당시에는 드물게 작품집에 천연색으로 인쇄되기도 했다.
다시 4년 후인 1988년 4월에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제5회전을 열었다. '快日明窓'등 71점이 전시되었는데 이번에는 출품점수도 많았으려니와 大作이 많아 관람자들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6곡, 8곡, 10곡 등 병풍과 375㎝×204㎝의 嗚呼賦, 232㎝×31㎝의 古硯銘 횡축, 170㎝×90㎝×5폭의 금강산절승10경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筆興이 有餘하였음을 보여준 '활기찬 전시회'였다는 세평이었다.
1994년 3월에는 七旬展을 서울의 덕원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제5회전으로부터 6년만이었다.'不倒翁'을 비롯, 大小作 82점이 전시되었다. 선생은 이 전시회에 대담한 창작품을 내놓았다. 靑墨으로 대련구 '一室淸風蘭氣 半窓明月梅花'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淡白한 유려미를 표출했다든지 '鳳栖碧梧' '邨情山趣' 등은 화선지류가 아닌 아트지에 휘호함으로써 붓 자취가 鮮然히 나타나는 대담한 시도, 그리고 還山別曲과 江村別曲을 山形化하여 원근감의 입체적 효과를 빚어낸 것 등 독창적인 실험 작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선생의 한글 書美는 독보적이란 정평이 있거니와 國漢혼용서 또한 선생의 行草美와 어우러져 새로운 경지를 일구어내고 있었다.
도록 서문의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으나 蛇足을 달고 싶지는 않다. 法官은 判決로 말하고 作家는 作品으로 말한다 했으니까'라고 했으니, 이야말로 진실로 촌철의 경구(警句)라 하겠다.
다시 6년 만에 제7회전을 서울 공평아트홀에서 개최하였다. 새 천년을 여는 초봄 3월1일, 75회 탄신기념으로 75점을 출품했다. '일필휘지한 率意의 作도 더러 있고 필흥에 겨워 客氣를 부렸음직한 대담한 실험작도 없진 않다' 고 실토하였듯 실로 백화난만한 盛事였다. 작품의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고 時宜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든지 글씨달력, 茶卓褓, 커튼, 전등갓 등 생활속에 書가 어떻게 효용 되는가를 보여주는 진일보한 배려는 서예애호인들 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현장 휘호의 퍼포먼스로 老益壯을 과시하였고 '감상안내'의 팜플렛을 발행하여 감상자들을 작품 앞으로 다가서게 하였다. 과연 서예 교육에 일생을 받쳐온 선생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의 일단이었다.
선생은 교육 관련 기관의 작품 청탁은 기꺼이 응하였다.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한국교육사고(史庫)에 '法古創新' 편액을 써 보냈는데 사고 측에서는 자체가 발행하는 모든 학술저서의 속표지 첫쪽에 그것을 계속 등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연으로 몇 해후 1999년에도 역시 서울대의 大學史庫의 개관을 축하하여 '溫故知新' 편액을 쓴바가 있다.

〈논평 • 논설〉
1988년 4월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예술의 전당 서예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선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역설하였다.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서예부문과 국립현대미술관초대전의 서예부문을 서예관에서 맡아 독립된 서예대전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전의 정실심사 시비, 서단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방법을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서예관의 사회교육 기능으로 5백만(?)을 헤아리는 서예 인구를 거느린 사설 서예학원 및 서예교습소 선생의 재교육, 청소년을 위한 수련도장 개설,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펼쳐져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예술의 전당은 4년제 대학과정의 교육기능을 갖추어서 전문 서예인을 양성하는 한편 연구기능으로써 한국서예사의 정립, 이론체계의 확립 등 명실상부한 '서예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예강좌에의 참여〉
선생은 1972년에 종로구 공평동에 서실을 개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月汀墨緣'이라 이름 한 선생의 門徒들은 과연 몇 사람일지 헤아릴 수가 없다. 회원들의 습작전 회수가 격년으로 이미 17회를 헤아리고, 20년 넘게 사제의 유대를 도타이 하고 있는 문도 중에는 거의가 일가를 이루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法古創新'은 당신 개인의 서예이념이자 지도방침이어서 임서 지도가 철저하였기 때문에 시류를 타는 성급한 서학 도는 선생의 교편에 배겨내지를 못했다. 따라서 회원수가 줄어들어 서실 운영이 원활치 못하여도 결코 개의치 않았다.
지금도 선생의 문하에는 20여명의 회원이 주기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고 경향각지에서 서실을 개설하여 후진을 지도하며 '敎學相長'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
선생은 한국일보문화센터와 문예진흥원 교양강좌 등에도 출강하여 서예 진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잡지에 자주 기고하여 서론과 논설을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조선일보에 한자필법의 도해와 설명을 곁들인 '서예교실'을 192회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서예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1986년 7월에는 KBS?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에 출연하여 학동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서예의 정신적, 심미적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1987년에는 춘천MBC TV에서 장시간 에 걸쳐 선생의 서 예술을 소개한 바 있다.

〈초대출품(국내)〉
선생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출품 한 것은 1983년이 처음이었다.'국전'이라는 공모전을 거치지 않은 재야작가가 초대되기는 처음이었는데, 선생은 이때 '遊智異山詩'를 출품하였다. 1985년에는 '龍將白雨…'를, 1987년에는'江碧鳥逾白'을, 그리고1989년에는 '非文章書'를 출품하였다. 이것은 書의 감상가치는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書美의 요소가 그 대상이라는 당신의 부분적인 지론을 형상화한 실험작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이 전시회의 다음 회에 다시 '文章이 아니어도 書는 예술이다'라고 款記를 붙인 非文章書를 출품하였지만 역시 반응이 없음에 선생은 실망(?)하였지만 지론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기에 2003년의 '물파전'에는 '惑星에서 온 편지'라는 명제의 대담한 실험 작을 선보였던 것이다.
喜壽를 넘어 팔순을 바라보는 노작가의 어디에 이와 같은 젊은이 못지 않은 실험의지가 숨어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이는 아마도 일관된 야인기질의 바탕 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정신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의 굵직한 주요 초대전 출품을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美協展 '竹密何妨…'
1988년 예술의 전당 '三儀?五輪'
1992년 영남대학교 '君子之行…'
1992년 전북대학교 ‘梅月堂 詩'
1993년 예술의 전당 '詩를 좇아 金剛行'
1994년 예술의 전당 '서울주제 서예큰잔치 '三峰詩'
1995년 서울시립미술관 '三角雪消…'
1996년 서울시립미술관 '錄樹陰濃…'
1996년 예술의 전당 '朴淳詩'
1997년 全北비엔날레 '黃梅泉絶命詩'
1997년 서울市立미술관 '萬物靜觀…'
1997년 예술의 전당 飮酒八仙歌'
2000년 서예로 Anhonest man′s
2001년 한국서학회 하와이전 '구름에 달 가듯이…'
2001년 통일미술대전 '꿈에도 소원은 통일'
2002년 한국서예문화진흥연합회 ‘飛翔'

〈초대출품(국제전)〉
1977년 국제서도연맹 동경전
1980년 국제서도연맹본부초청 2인전(일본?동경)
1983년 중국역사박물관(대만)초청 한국현대서화전(출품및참석)
1986년 한?불수교 100주년기념 파리전(출품및참석)
1990년 제6회 국제난정필회 상하이전을 시작으로 일본동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제남, 서안, 타이완, 나포리, 파리 등지에서의 국제전에 출품 및 참석
2000년 상해국제문화교류협회초청으로 上海中國畵院에서 개인전
선생은 한국난정필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오늘까지 15회의 국제서법전에 회원을 인솔하고 현지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會勢의 확충과 국제간의 서예 교류를 통한 우호중진에 힘씀으로써 한국서예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 컸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이 밖에도 선생의 집필 활동 또한 왕성하였다. 동화작가로서의 작품 활동도 꾸준하였지만 서예 분야에서의 집필을 간추려보면, 1974년에 한국일보에 '書藝夜話' 11회의 연재를 비롯하여 '月刊書藝' 誌 '書藝文化'誌, '까마' 誌 등에 批評?隨想등 매거(枚擧)키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선생의 서예인생 60년 역사는 비록 서예를 지향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를 이해하는 모든 이들이 본받을 그런 발자취가 아닐까 한다.

〈書蹟碑 建立〉
이 원고가 마무리될 무렵 또 하나의 朗報가 있었기로 末尾에 적어 披露한다.
「筆歌墨舞」란 書蹟碑가 선생의 모교인 咸陽初等學校 교정 一隅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선생의 春秋 여든 되심을 축하하는 門下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이 글씨碑는 높이 약 3m의 자연석에 선생의 힘찬 草書體로 전면을 장식하고 碑側에 다음과 같은 自詠의 一文이 새겨졌다.
「단계석 고운 벼루에 백자연적의 정화수 따르어 지긋이 눈 감고 조용히 먹을 간다. 명상은 나래를 펴고 맑은 묵향 속에 양호 장봉 다듬어져 붓을 잡은 손 끝에 힘이 실리면 지필묵연 하나 되고 나도거기 어우러져 筆歌墨舞 墨歌筆舞 興도 有餘하거니와 좋은 文詞 골라 쓰며 마음의 때를 씻고 名詩를 음미하며 오늘도 먹을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