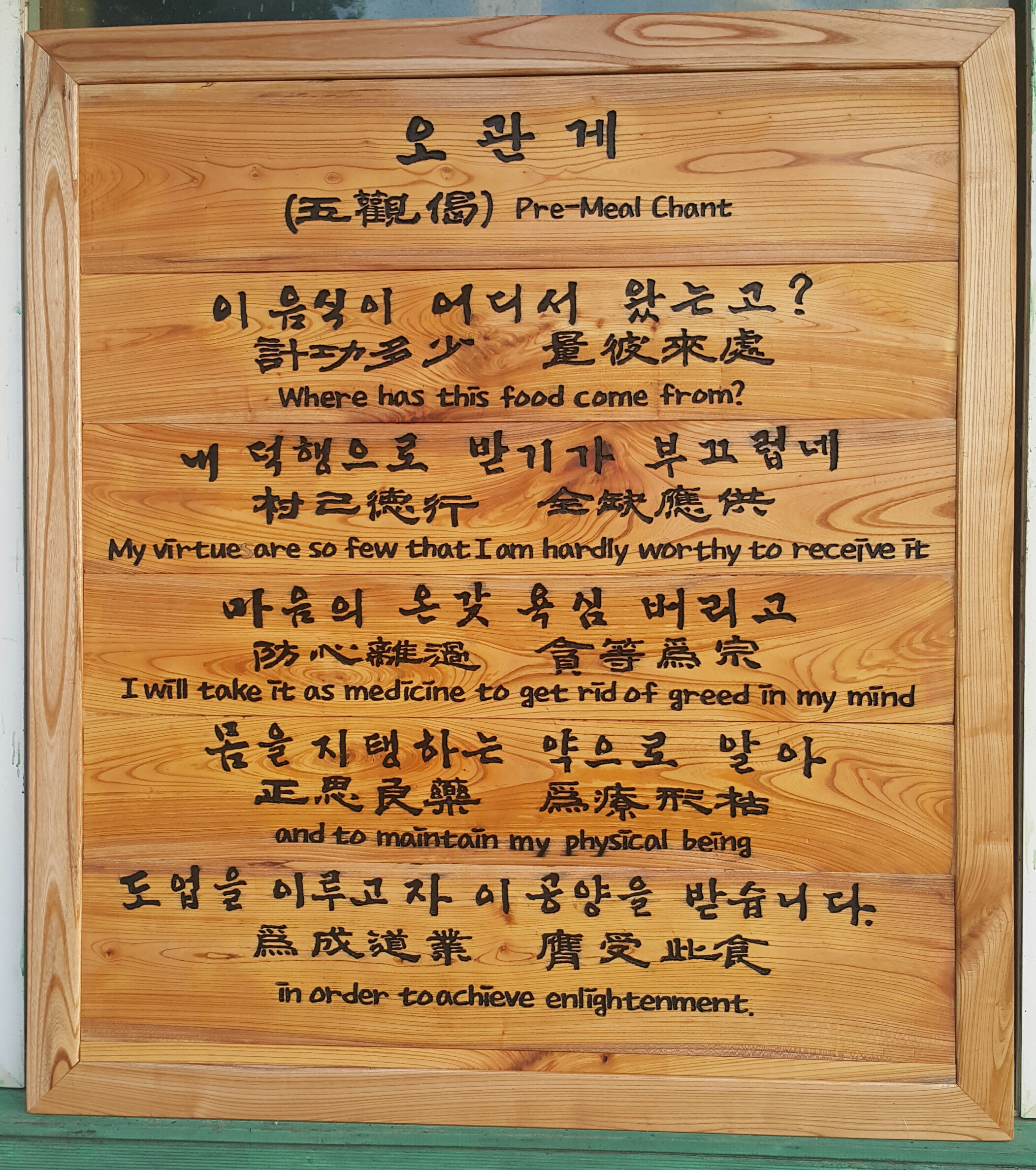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백자부'의 시인 초정 김상옥(9)
2007-09-17 09:30:00 |
다섯 시인이 만날 때는 식사와 술을 한 뒤 제 흥에 취한 대로 시낭송을 했다. 초정이 먼저 뽑았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여름산 같은/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이렇게 앞메기 소리로 뽑으면 이어 아천이 뒷소리로 받는다. "靑山이 그 무릎 아래 芝蘭을 기르듯/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목숨이 가다 가다 농울쳐 휘어드는/오후의 때가 오거든,/내외들이여 그대들도/더러는 앉고/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하고 아천이 숨을 좀 쉬는 동안 초정은 "그래 갖고 안되겠다. 더 유장해야 한다니까……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 보고/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어느 가시덤불 쑥굴헝에 놓일지라도/우리는 늘 玉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인인 것이다." 하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초정은 서정주의 ‘무등(無等)을 보며’를 암송하고 나서는 "서정주라는 인간은 싫은데 시는 귀신이란 말이야" 하고 덧붙이기를 잘했다. 그때 필자가 "선생님, 이 시는 서정주 초기의 '생명의식의 고양(高揚)'에서 동양적 느슨함으로 물러난 것이라는 평이 있는데요."하면 "동양이고 생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인은 시로써 말하는 것이야. 이 시는 한 편의 흐르는 시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흐름,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지…"하고 일러 주었다.
필자에게는 대가들이 불러 준 자리만에도 행복인데 은사이신 미당의 시에 심취한 자리라는 점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 김석규 시인은 청마 선생의 시로 관심이 넘어갔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좌장인 초정은 청마의 '청'자도 끄집어 내지 않았다. 이때 우리들의 시연(詩宴)에는 인간문화재 성계옥 이사장도 더러 동석했다. 아천과 초정이 성이사장의 춤과 교양을 관심 깊게 보고 있었던 때였다. 성이사장은 미당의 <무등을 보며>가 낭송되는 동안 어깨로 춤사위를 지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필자는 그때 이후 그분의 눈길에서 '팔검무'나 '의암별제'가 농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이 무렵 초정은 필자의 제2시집 '풍경보風景譜'를 늘 좋게 평가했다. 오자회동(五者會同) 때 "강선생, 강선생 시 <논개사당의 단청>을 진주에서 아는 사람이 있나? 있다면 좋고…"라 말하면 아천은 "그 말씀이 좀 섭섭하네. 우리 식구의 시는 안 챙기시고…"하곤 했다. 초정은 "시집이 나오면 챙기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초정이 챙겼던 시는 다음과 같다.
천길 벼랑에 백일홍
가락지 모양으로 피다
피는 네 모양의
가락지 하나로 山
가락지 하나로 노을
가락지 하나로 바위
가락지 하나로 또
하늘을 갈아 끼다
손가락 열이 열 번을
바꾸어 갈아끼자 백일홍 꽃빛
丹靑이 되어 들보의
몇 군데 그려져 남다
ㅡ강희근의 ‘論介祠堂의 丹靑’전문
'초정 김상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영 초정 김상옥 거리 선포 (0) | 2008.01.07 |
|---|---|
| 백자부의 시인 초정 김상옥 10 (0) | 2008.01.06 |
| 백자부의 시인 초정 김상옥 8 (0) | 2008.01.06 |
| 백자부의 시인 초정 김상옥 7 (0) | 2008.01.06 |
| 백자부의 시인 초정 김상옥 6 (0) | 2008.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