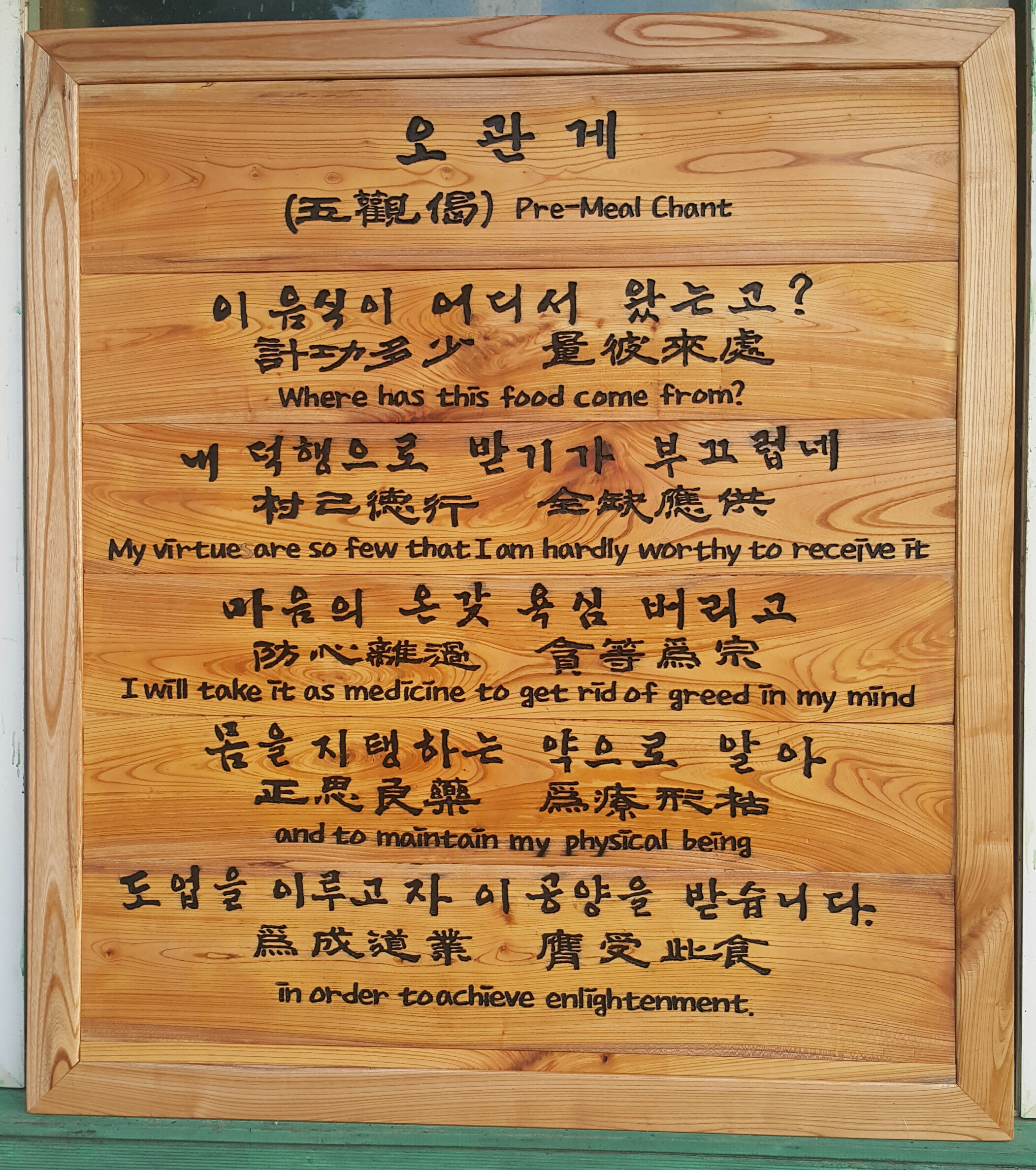행초로 휘호한 무위자연의 미학
-석송 이종호 작품전에 부쳐-
서예는 다른 조형예술과 다른 특징이 있다. 곧 객체(客體)에 대한 재현을 위주로 하는 예술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문자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서예가에게는 기본적인 서사역량과 함께 뚜렷한 예술철학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석송(石松) 이종호(李鐘祜)에게 있어 지난 첫 번째 전시의 의미가 그 동안 공부해 온 서사역량을 보여주는데 있었다면, 이번 두 번째 전시는 그가 지향하고 있는 철학의 일단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전시 이후 그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면서 노자(老子)에 심취하게 된다. 2천 6백년 전의 노자는 하늘을 담는 허공,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의 도(道)를 오천여자의 글자를 사용하여 세상에 남겨놓았다. 그 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노자(老子)의 도덕경이다. 그런 연유로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가운데 35장을 골라 작품으로 꾸며놓았다.
필자는 이번 작품에서 눈여겨 본 대목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거의 모든 작품을 행초서(行草書) 위주로 제작하였는데, 행초는 작가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임의성(任意性)이 크기 때문에 고전적인 틀에 고정되지 않고 가장 원활하게 자신만의 글씨를 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자의 도덕경에 담긴 철학적인 내용의 중심인 무위자연(無爲自然), 노자의 처세술로 널리 인용되는 화광동진(和光同塵) 등 노자사상을 대표할만한 글귀들을 하나씩 독립된 작품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문자의 외적인 형태만큼이나 도덕경을 읽은 작가의 내면정신을 전하는데도 비중을 두어 형신(形神)일치를 실현코자 한 시도로 여겨진다.
석송은 “뭔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 ‘노자’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붓에 맡겨 휘호하고자 했다”라고 말한다. 작가의 생각이 거짓없이 녹아들어 있는 예술, 바로 그것이 무심(無心)과 무위(無爲)를 주창한 노자의 철리(哲理)일 것이다. 따라서 노자가 말한 “뛰어난 기교란 어수룩해 보이는 법”이라는 의미의 대교약졸(大巧若拙)이나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뜻의 도법자연(道法自然)과 같은 노자철학을 닮은 무위자연적 메시지가 이번 전시의 본질이고 특성이다.
무위자연과 대교약졸의 미의식
노자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예 또한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 문자를 서사하는 예술이다. 서예작품은 문자의 고전적 형상을 원형대로 임서하거나 그 원형과 다른 변형의 미학적 의미를 추구하다보면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써낸 ‘또 하나의 다른 자연’이란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자연주의 미(美)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미(美)다. 흔히 우리의 미술이나 서예를 말할 때 정제미와 함께 붙어 다니는 ‘자연의 미’라는 수식어가 있다. 무심, 무기교의 기교, 질박과 소박미 등의 수사는 무위자연의 미에 대한 구체적 언어다. 무위(無爲)란 글자 그대로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위(作爲)가 없는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다. 또 선종(禪宗)에서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지를 무위라고도 한다. 바로 무위자연은 타고난 그대로 꾸밈이 없는 상태로서 천연의 모습이 자연에 합일되는 것이며, 서예정신의 심미적 요구에 부합되는 개념이다.
석송의 이번 작품들 가운데 가장 큰 작품은 병풍(160x360㎝)으로 제작된 <도법자연(道法自然)>이다. 이 글귀는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도는 자연을 본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병풍에 ‘도법자연’이란 네 글자를 자연스럽게 휘호하기 위해 마음비우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한다. 맘속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법이다. 숙련된 기교를 벗어던진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한의 채옹(蔡邕)이란 사람은 일찍이 서예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내 놓은 것[書者散也]”이라고 하였던가. 고전에 의지해 집자하듯이 작품을 하기보다 그 고전을 넘어서는 심수상응(心手相應)의 무기교가 바로 무위자연인 것이다. 이 작품의 장법(章法)도 고전적인 방법에서 많은 변형을 가하여 아랫부분을 크게 비우고 거기에 큰 여백을 만들었다. 서예에 있어서 여백의 중요성은 계백당흑(計白當黑 ; 흰 공간을 계산해서 검은 획을 적당하게 배치함)이니 지백수흑(知白守黑 ; 흰 것을 알아서 검은 것을 지켜나감)이니 하면서 강조되어 왔다. 이렇듯이 예로부터 문자를 공간에 맞게 배치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점획의 대소(大小) 장단(長短) 경중(輕重) 소밀(疏密) 등에 신경을 써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서론(書論)이 그것이다. 주역에 하늘의 도는 쉽고, 땅의 도는 간결하다는 대목이 있다. 복잡하면 이해가 어렵고, 상호간에 소통도 힘들다. 복잡하면,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의 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간결하고 진실하면 쉽게 통하게 된다. 군더더기를 털어버리고, 간결하게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는 이치와 같다. 여백을 살리면 채워지는 이치를 깨달은 석송의 장법은 고전적인 장법에서 일탈되었지만 신선해 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도덕경의 매 장에 나오는 주제어 몇 자를 다른 서체로 크게 서사하여 무미건조함을 덜어준 뒤 나머지 내용을 발문처럼 행초서로 작게 휘호하였다. 작품마다 공간처리를 달리하고, 거침없이 내달린 행초서에서 동적인 느낌과 구속되지 않는 무작위의 멋을 풍기고 있다.
화광동진의 자세로 빚어낸 부드러움의 미학
자기의 재능을 감추고 속세의 사람들과 어울려 동화한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은 노자의 독특한 처세술이다. 도덕경 56장에는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욕망의 근원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예리한 것은 뭉그러뜨리고, 얽힌 것은 풀어 주며, 빛나는 것은 부드럽게 하고, 먼지 같은 것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건 너무 이익을 주려 해도 안 되며, 너무 해치려 해도 안 된다. 어떤 것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도 안 되며, 너무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럼으로써 천하의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작품 <화광동진>에는 최근 석송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양하는 태도로 서예에 접근하려는 진지함 때문에 그의 예술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윤완묵회장을 비롯해 여러 지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 예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도(道)는 눈에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도에 가까운 것이 물[水]이란 것인데,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라는 의미의 작품 <상선약수(上善若水)>도 작가의 정신적 지향점을 드러낸 것이다. 물은 세상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도(道)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듯이 마음속에 평소 좌우명으로 새기는 글귀들을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어서 그의 정신경계를 가늠할 수 있다.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書如其人]”라고 하였던가. 문자의 외적 형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더 핍진하게 석송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52장)고 말하였다. 도덕경에 나오는 '유(柔)의 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획으로 살아있는 미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씨를 평가 할 때 살아있는 획으로 쓰여졌는가 죽어있는 획으로 쓰여졌는가는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생동하는 획의 구사는 좋은 글씨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흔히 초보자들 중에 강호(强毫)의 큰 붓으로 눌러써서 나오는 굵은 획만이 힘있는 획인 줄 알고 선호하며 이를 구사하려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한 획을 얻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도리어 뻣뻣하여 죽은 획을 만들어 내기 일쑤이다. 생명(生命)이 숨쉬는 획을 얻으려면 온기가 느껴지는 획이 구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딱딱한 뼈를 부드러운 살결이 감싸고 있는 듯한 획 속에 서자(書者)의 정신이 숨쉬고 있는 획을 구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도덕경에도 “부드러움이 결국 강한 것을 이긴다[柔弱勝强剛]”라고 하였다. 따라서 석송도 작품을 휘호할 때 시선을 자극할 정도로 짙은 먹빛을 내는 농묵보다 수용하기 부드러운 담묵을 사용하였고, 강호(强毫)보다 계호(鷄毫)나 양호(羊毫)를 사용하여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스며들게 하였다고 한다. 화선지도 감상자의 눈을 사로잡는 원색보다 흰색 그대로의 화선지를 사용하고, 붓도 눈을 속여 거센 힘을 드러내 보이는 강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노자철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졸박함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있다. 소박한 붓질, 순박해 보이는 점획처리를 한 작품 <대교약졸(大巧若拙)>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는 바로 도덕경 45장에서 “큰 기교는 졸박한 것과 같다”는 노자의 미의식이 녹아있다. 노자가 말한 대교약졸은 본래 도의 무위자연성과 관련이 있다.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기교는 천도(天道)에 순응(順應)하는 것이다. 졸(拙)은 단순히 졸렬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졸이 아닌 기교의 최고경지로서의 졸인 것이다. 이러한 대교(大巧)를 갖추어 대미(大美)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손재주를 익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마음을 밝혀 천인합일(天人合一)과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체득(體得)한 후 자연에 동화(同化)된 서예(書藝)를 구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기교가 배제된 졸박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 <화광동진>에서 석송의 이러한 시도가 엿보인다. 생각 없이 술술 써내려간 듯한 천진스러운 질박의 미학이 돋보인다.
도덕경 마지막 81장은 “성인은 쌓지 않는다[聖人不積]”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서예에 있어 도를 닦는 다는 것도 결국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차원 높은 무위자연의 글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석송이란 그의 호 외에 ‘자운(自雲)’ 이란 호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잡다한 것들을 훌훌 내려놓고 스스로 구름처럼 살겠다는 마음에서 붙인 자호(自號)라고 한다.
이렇듯이 석송이 시도하고 있는 무위자연의 미학은 결코 기법의 수련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맑은 인품과 꿋꿋한 삶속에서 터득된 외적인 기법과 내적인 철학이 합일된 하나의 결실물인 것이다. 그 동안 20년 넘게 다양한 서체의 기법연마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왔던 그가 이제 스스로 철학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동양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고 시야를 넓혀 새로운 서예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번전시를 그가 창조적인 서예세계를 일궈나가기 위해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고 비워가는 선변(善變)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늘 그를 지켜보는 평생 도반(道伴)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축년 봄날 삼도헌에서 정태수(한국서예사연구소장)
|
'작가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우리시대 미감을 돌 위에 새기는 작가(해민 박영도 선생의 전각세계) (0) | 2010.12.28 |
|---|---|
| [스크랩] 서예가, 화가, 전각가인 김양동교수 (신동아) (0) | 2010.12.28 |
| [스크랩] [클릭다시보기] 계명대 서근섭교수가 본 삼도헌의 시각,, (0) | 2010.12.28 |
| [스크랩] 송민 이주형의 득의망언得意忘言 서예미학 (0) | 2010.12.28 |
| [스크랩] 궁체에 삶을 싣고(난정 이지연선생의 궁체사랑) (0) |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