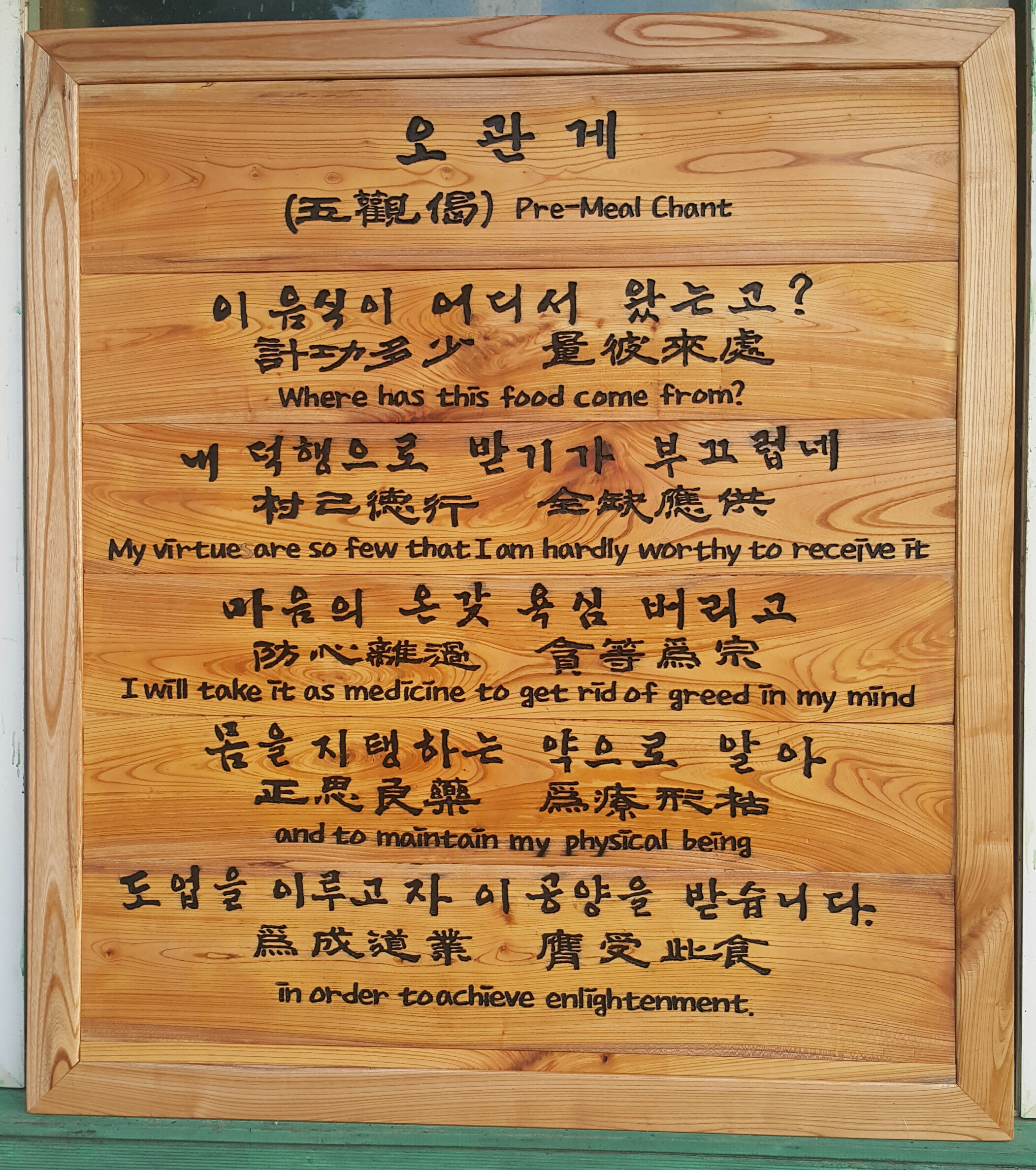“못나 보이는 글씨 쓰고 싶었다”
세번째 전시회 ‘무엇인가’ 여는 서예가 전명옥씨
한겨레신문 정대하 기자
창암 선생 일흔에 이룬 4대강 사업 등 한석봉 천자문 펜습자 교본을 붓으로 써 보았다. 느낌이 좋았다. 중학교 때 붓을 처음 잡아본 뒤, 서예를 잊고 살았다. 대학에 진학해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 여름방학 때 목포의 한 사찰로 참선을 떠났다. 운명이었을까? 정각 스님은 그에게 참선에 가장 좋은 것이 서예라며 붓을 건넸다. 법당의 은은한 먹 향기가 마음속 깊이 안겨왔다. 전명옥(56·전 한국서예협회 이사장·사진)씨는 대학 졸업 후 광주로 스승을 찾아갔다. 근원 구철우(1904~l989) 선생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서법을 배웠다.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과 가까웠던 스승은 남도의 독보적 서예가이자 문인화가였다. 점차 글씨에 끌렸다. 글씨를 쓰다보면 날이 샜다. 전씨는 “글씨에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1983년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힘을 감추고, 못나 보이는 글씨를 쓰고 싶었다. 상도 타고, 대학원에서 이론도 공부했지만 허전했다. 한자에서 벗어나 한글과 알파벳을 해체해 썼다. 글씨에 회화적 요소를 도입했다. 실험적 경향에 “신선하다”는 호평과 함께 비판도 쏟아졌다. 80년대 ‘금수(禽獸)강산’이라는 작품으로 전두환씨를 비판하는 등 현실에 참여했다. 올해도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나-흐르고 싶다’라는 작품을 썼다. 여백의 미와 선을 중시하는 서법이 작품 내면에 스며 있다. 그는 스승이 준 담헌이라는 호대신 스스로를 ‘머엉’이라고 부른다. 멍하다는 뜻이다. 전씨는 2~17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 초대전을 준비하면서도 정신이 없었다. 고민 끝에 세번째 전시회의 제목을 <무엇인가>로 붙였다. 삶이, 죽음이, 사랑이, 욕심이, 허공이, 그리고 서예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다. 401개 작품들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멍하다. (062)225-5333. | ||||||||||||||||||||||||||||||||
'작가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송민 이주형의 득의망언得意忘言 서예미학 (0) | 2010.12.28 |
|---|---|
| [스크랩] 궁체에 삶을 싣고(난정 이지연선생의 궁체사랑) (0) | 2010.12.28 |
| [스크랩] 갈뫼 김지수 캘리그래퍼 (0) | 2010.12.28 |
| [스크랩] 손경식선생의 서예세계 (0) | 2010.12.28 |
| [스크랩] 영남한글의 새길을 연 혜정 류영희선생의 50년 서예역정 (0) | 2010.12.28 |